
요즘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기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심지어는 논문도 쓴다. 검색창에 ‘보고서 써줘’라고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완성된 결과물이 눈앞에 나타난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천재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
AI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집합체’다.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통계를 기반으로 예측한다. 예를 들어, 챗봇은 인터넷의 텍스트를 학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이미지 생성 AI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런 능력을 보면 우리는 쉽게 감탄한다. AI에 감탄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 ‘똑똑함’은 이해의 똑똑함이 아니라 계산의 똑똑함이다.
AI는 문맥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저 비슷한 패턴을 찾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내뱉을 뿐이다. 즉, AI는 정답을 잘 찾아내지만,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AI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가?’라고 한다면, 학습된 데이터 속 도덕 규범에 따라 나쁘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양심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인간처럼 죄책감을 느끼거나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의 지혜는 다른 곳에서 나온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아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건넬까? 라는 질문에 AI는 위로의 문장을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닿을지는 알 수 없다.
인간은 상대의 표정, 말투, 상황을 종합적으로 느끼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는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작동한다. 지혜란 바로 그 복잡한 판단의 예술이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다. AI는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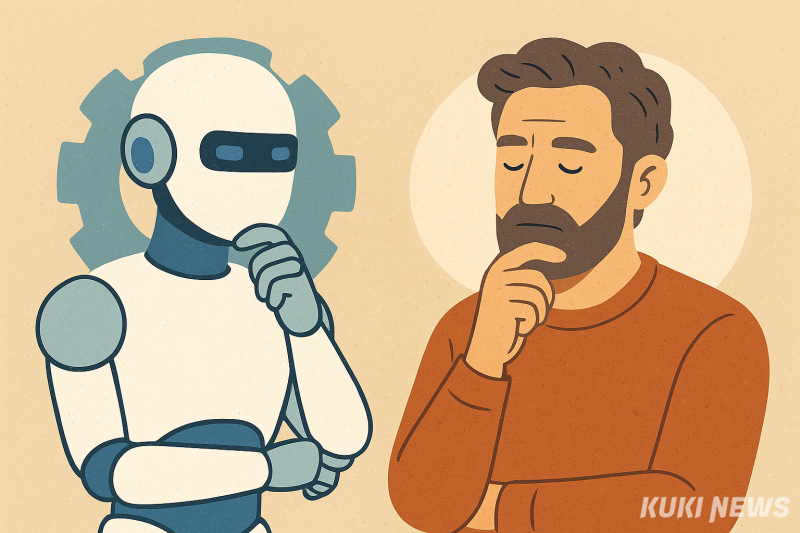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AI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추천, 뉴스 큐레이션, 쇼핑까지 우리의 일상은 ‘AI의 제안’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생각하는 능력은 줄어들고, 판단을 위임하는 습관은 늘어난다. AI가 대신 써주는 글, 대신 골라주는 콘텐츠, 대신 정리해주는 노트. 우리는 점점 ‘선택하는 인간’이 아니라 ‘선택받는 인간’이 되어간다. 똑똑한 도구가 생겼지만, 그만큼 지혜를 발휘할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다. 결국 중요한 건 도구보다 태도다. AI는 ‘결과’를 만들어주지만,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한 가지는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는다. 그것은 공감과 책임이다.
AI는 감정을 흉내 낼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AI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지혜는 바로 그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오늘날 이 말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AI가 우리 대신 ‘생각하는 척’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AI가 제시하는 답을 무조건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지혜를 잃는다. 기계는 실수하지 않지만, 인간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
AI는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지혜로운 인간은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본다. AI가 보여주는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다.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장 하나로 귀결될 때 AI는 지식을 주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쓸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로운 인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