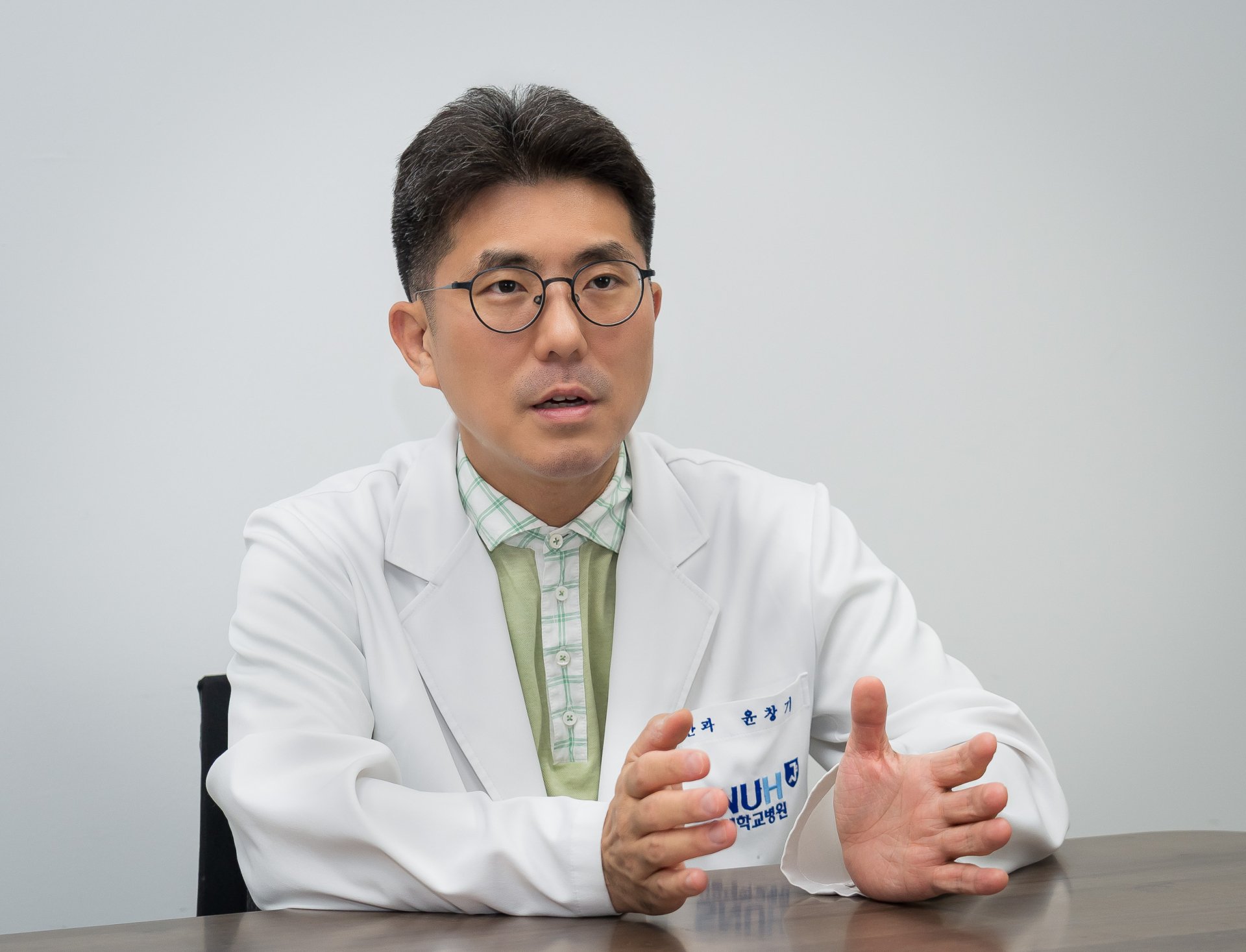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어르신 저 왔어요. 우리 취재한다고 기자도 같이 왔는데...”
침대에 우뚝하니 앉아 티비를 보던 백발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초면에 어색함을 풀고자 질문을 마구 던졌다. 언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았는지, 몸은 어쩌다 반신마비가 왔는지 등을 묻자 그는 그 기나긴 세월을 느릿느릿 이야기했다. “그럼 가족과 통화는 자주 하세요?” 어르신은 말이 없었다.
재가요양보호사 한희숙(가명·57)씨는 9년째 아침마다 정호연(가명·80)씨의 집을 찾는다. 정씨는 반신마비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이자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로 한씨에게 하루 3시간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정씨는 현재 왼쪽 팔부터 다리까지 굳어져 혼자서는 외출은커녕 밥을 챙겨먹기도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다. 겨우 엉덩이에 방석을 깔고 앉아 끌어서 이동하는 처지다. 아내도 정씨와 같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40여년 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어떻게든 살아지더라구요"
노인요양현장에는 ‘어떻게든’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그야말로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버틴다. 한씨는 총 3명의 어르신을 맡고 있다. 오전 6시경 A어르신의 집으로 출근해 운동 및 야외활동을 돕고, 9시쯤에는 정씨의 집으로 가서 식사 준비와 목욕,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후 1시가 되면 또 다른 B어르신의 가정으로 이동한다.
정씨는 그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이다. 혼자서는 거의 활동이 어렵고, 잠깐이나마 돌봐줄 가족도 없기 때문이다. 매일 오후 4~5시 저녁 무렵이 가까워지면 한씨는 다시 정씨의 집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한씨는 “보통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지만 이 어르신 댁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들러서 식사를 챙긴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에게는 최대 주 6일, 하루 3시간의 서비스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병원에 가는 날은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집 밖으로 모시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또 병원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3시간을 훌쩍 넘기 일쑤다. 때문에 한씨는 병원에 가는 날에는 남편과 아들을 동원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한 후 방문 시간을 늦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야외활동은 물론 병원을 자주 오가야 하는 치과 진료 등은 선뜻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비전문가 치료, 일명 야매치료도 불사한다. 2년 전 정씨는 탈장 증상이 나타났지만 입원치료비, 간병인 고용비 등의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한씨가 삐져나온 탈장부위를 위로 올리는 식으로 마사지해 겨우 제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한씨는 “당장 치료가 어려우니 아쉬운 대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정성이 먹혔는지 다행히 지금은 탈장된 부위가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나중에 다시 나빠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며 “사람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지더라”라고 말했다.
◇"세상 공평치 않아…야박한 현실 봐 달라"
노인요양현장에는 불합리한 점도 적지 않다. 한씨는 “요양등급 선정도 문제”라며 “모든 사람에 공평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어르신은 몸도 건강하고 활동에 문제가 없는데도 높은 등급을 받아서 더 오래 서비스를 받는가하면, 어떤 어르신은 높은 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또 우리 어르신처럼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는 분들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다”며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등급이나 제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를 받는 정씨도 마음이 쓰인다. 정씨는 “(한씨가) 거의 10년이 가깝게 생활을 돌봐주고 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면서도 “예전에는 하루 4시간씩이었는데 이제 3시간으로 줄어드니 어떤 때는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고 간다. 내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급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제도의 빈틈은 결국 요양보호사 개인의 노동력으로 채워진다.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면 요양보호사가 개인 시간을 따로 내고, 인력이 부족하면 가족 등 개인 인맥을 동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요양보호사들에 너그럽지 않다. 요양보호사들이 평균 두세 건의 서비스를 담당함에도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급여에 책정되지 않는다. 남의 식사를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끼니는 챙기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수당이 추가로 붙는다. 그런데 지난해 한씨가 일했던 센터에서 ‘정년’ 조항을 신설하는 바람에 다른 센터로 옮겨야 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정년 개념이 없는 데도 말이다. 기존 경력은 지워지고 다시 경력 1년차로 돌아간 셈이다.
오후 12시 30분쯤 어르신의 집을 나선 한씨는 또 다른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직장인들에게는 한창 점심식사 시간이었지만, 한씨에게는 맘 편히 앉아 식사할 여유가 없어보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