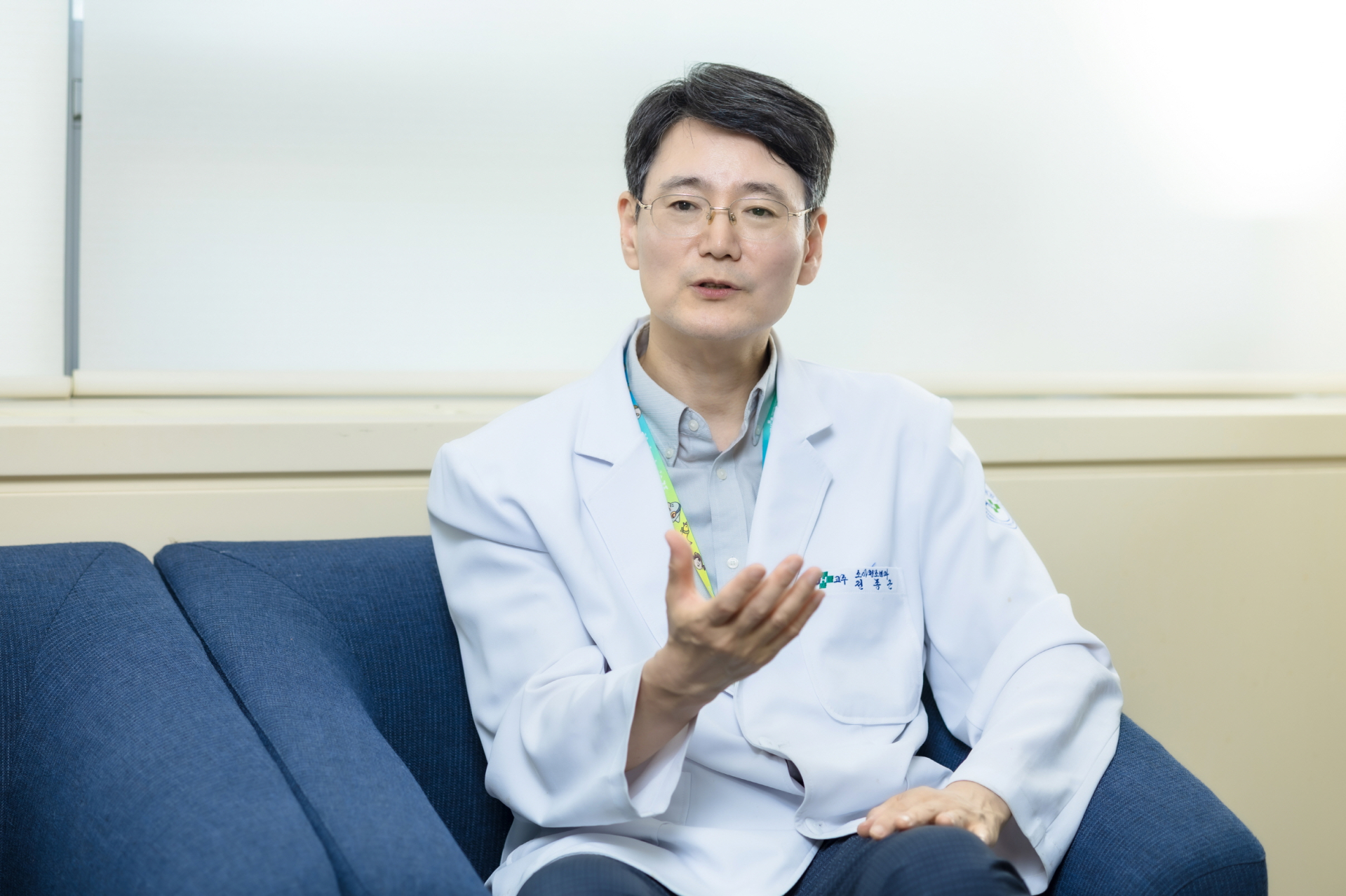우리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많다. 유형원,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이 그들이다.
우리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많다. 유형원,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이 그들이다.
유형원은 조선중기 실학자다. 그는 농촌체험을 바탕으로 쓴 ‘반계수록’에서 국가 통치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유형원은 토지제도가 모든 개혁 기초가 된다고 파악한 중농사상에 입각해 백성들에게 논 40마지기(1마지기=논 200평) 토지를 분배해 경작농지를 확보케 하자는 ‘균전론’을 주창했다. 그는 이 토지에 근거해 세금과 병역을 부과해 행정 합리화를 꾀하고자 했다.
유형원은 또 토지개혁을 달성하려면 정치세력 개편과 정치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관료제와 과거·교육·행정제도, 향촌사회 조직을 새로 꾸렸다. 유형원은 또 신분차별 제도를 비판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면서 최초 근대적 거시경제정책 입안자로 불린다. 그는 재정·통화정책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했다. 정약용은 쌀값과 무명 값을 비교해 쌀값이 크게 오르면 곡식을 풀고 반대이면 쌀을 비축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오늘날 정부가 경기변동에 대응해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유사하다. 정약용은 또한 통화발행 주체를 통일해 통화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권 비용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는 현재 통화정책 요체라는 평을 받는다.
정약용은 이밖에도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관리를 줄여야 하며 관리를 등용할 때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정부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조직내부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논리와 같다.
정약용은 또한 세제를 정비하며 전매사업이던 소금부문을 민영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오늘날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촉진시키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과 유사하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사회 문제점을 실사구시(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측면에서 분석했다.
박지원은 저서 허생전에서 독과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독점이윤을 극대화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비꼬았다.
박지원은 허생이 당시 조선 경제 상황으로는 모은 돈을 쓸 곳이 없다고 해 바다에 버리는 묘사를 통해 국가경제에서 화폐 역할에 대한 선구자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박지원은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수송 편리를 위해서 차량제도를 도입하고 도로 확충을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