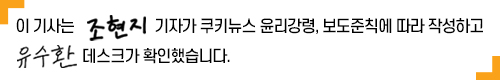“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매출이 안납니다”
명동 거리에서 닭꼬치를 판매하는 한 상인의 이야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울 거리 곳곳이 활기를 되찾았지만 명동은 예외였다. 40%대의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며 ‘텅빈 거리’ 분위기가 이어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중대형·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9.5%, 6.2%였다. 유명 식음료매장 개점 등으로 MZ세대의 유입세가 강한 망원역(소규모 1.7%, 중대형 4.2%)이나 동교·연남동(0.9%, 0.0%)은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한 자릿수 대의 서울 평균 상가 공실률과 대조적으로 명동 상권은 여전히 40%대의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명동 상권의 공실률은 중대형 40.9%, 소규모 42.1%였다. 4분기 공실률(중대형 50.1%, 소규모 50.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가 불러온 일상회복의 활기는 명동을 빗겨갔다. 29일 오후 찾은 명동 거리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공실 상태인 상가였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비워진 상가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임대’ 딱지만 붙어있었다. 명동 곳곳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빨간 점퍼에 빨간 모자를 착용한 관광객 안내 도우미도 거리를 지켰다.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이전만큼 상권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명동 거리에서 달고나를 판매 중인 한 상인은 ‘그래도 사람이 좀 많아졌다’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평일엔 대게 2~3만원의 매출밖에 못번다”고 탄식했다. 이어 “가게가 차야 사람도 올 텐데 거리가 너무 텅 비었다. 이러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도 명동이 외면 받을까봐 두렵다. 가게가 계속 비어있으면 외국인 투어에서도 명동을 안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동의 허전한 상권 배경엔 저조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2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나 명동 주 고객층이었던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상하이, 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렸다. 일본 역시 한·일 양국 간 관광 목적 방문객 입·출국 제한으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빈 점포들이 채워질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관광객 수가 낮은 상태에서 내수만으로 상가들이 채워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선 대표는 “유행 재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명동 상가들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만큼 눈으로 보이는 회복이 있어야 가게들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은 아직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명동 상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회복가능성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명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인 관계자는 “명동에 관광객만 오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금융회사가 많이 위치해있고 명동성당도 있다”며 “명동 상권이 죽은 이유가 오롯이 관광객 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전환, 예배 축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관광객 수요를 떠나 다른 요소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