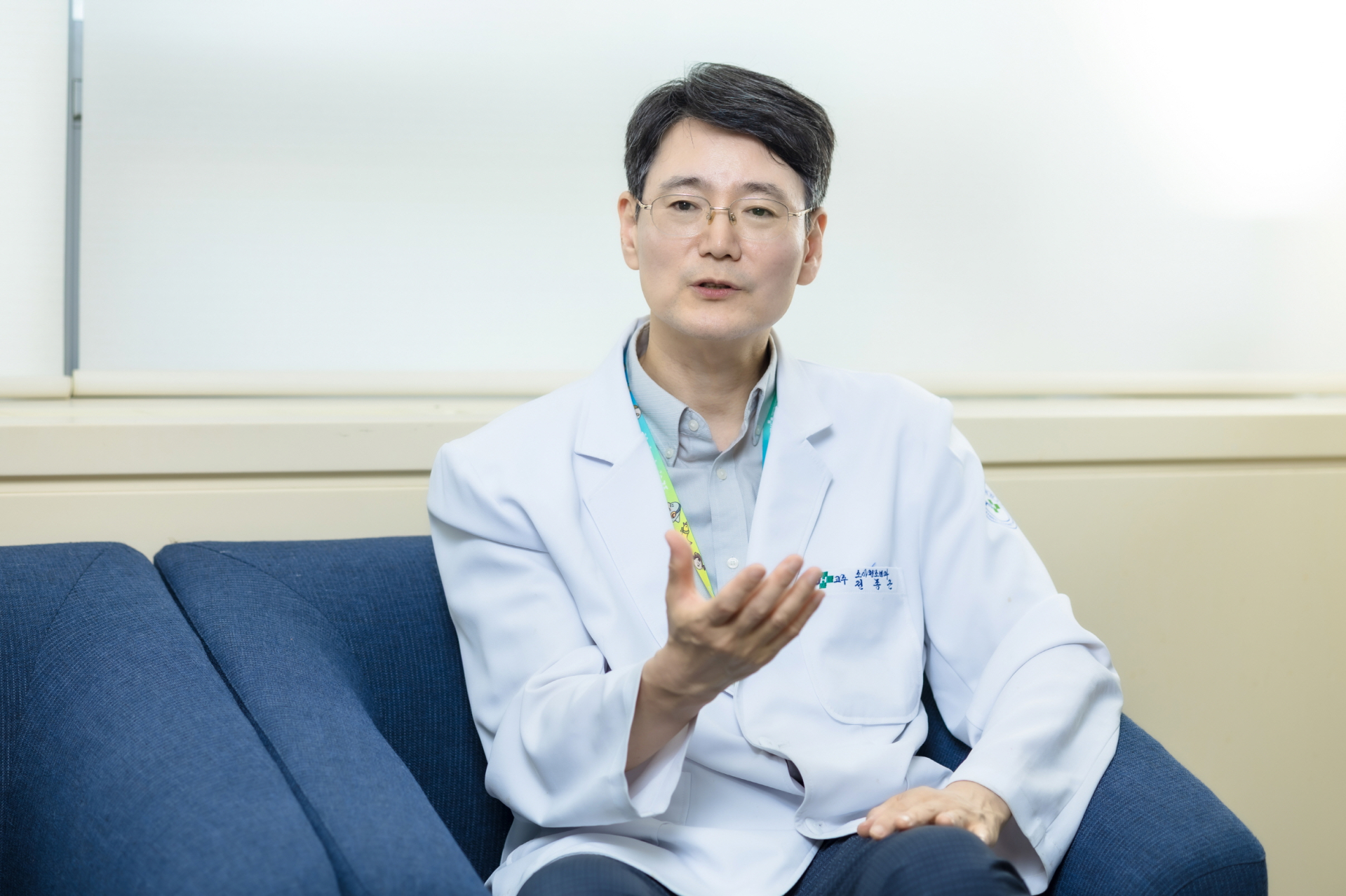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온건적인 대북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온건적인 대북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도 같은 날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고 묻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좋든 싫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 사회의 대북정책은 대화 대신 제재에 무게가 쏠려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립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9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를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1월 북한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안을 의결했다.
미국 또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은 대북 전략의 20~25%만 사용한 상황”이라고 북측을 향해 경고했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그간 북한에 유화적으로 대응하던 중국도 압록강 철교를 폐쇄하거나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등 대북 압박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향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한 상황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는 트는 수준의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