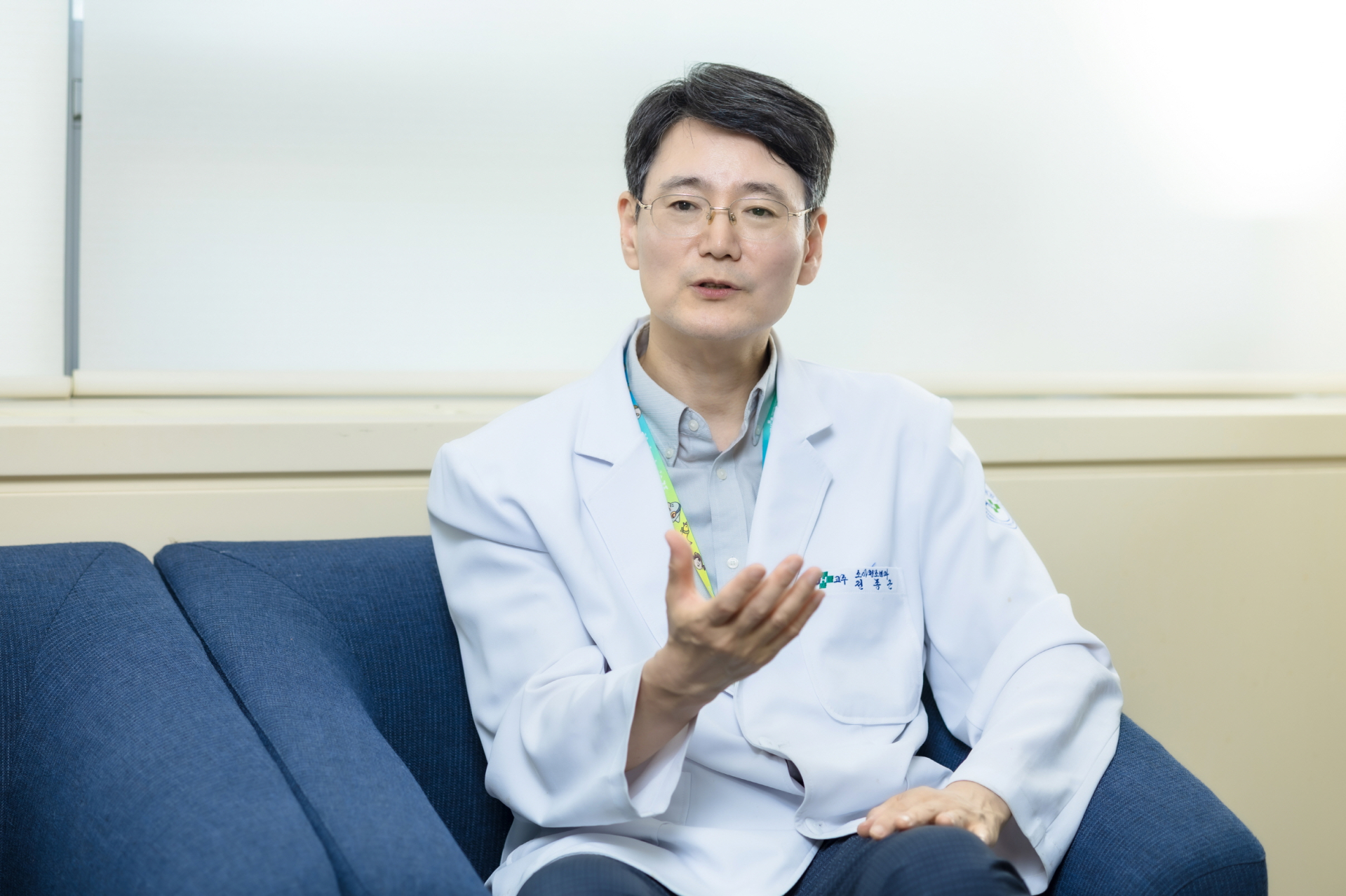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방부가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의 순직을 33년 만에 인정했다. 또 다른 군 의문사 장병에 대한 순직 인정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방부가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의 순직을 33년 만에 인정했다. 또 다른 군 의문사 장병에 대한 순직 인정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지난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이 결정됨에 따라 허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허 일병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는 지난 1984년 4월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과 머리 등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허 일병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판단했다. 유가족과 국방부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거 국방부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 의문사 장병에 대한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군인사법시행령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살’이라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유가족이 인정하지 않을 시, 순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규명 불능으로 군 의문사 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를 포함해 50명에 달한다.
군 의문사 장병 순직 불인정에 대한 부당함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각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에도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은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측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의문사 사망자의 순직 심사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의 순직 분류 기준을 개정, 진상규명 불명자를 순직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군 의문사 당사자에 대한 순직 심사도 가능하게 됐으나, 유가족 측은 진상규명 불명자 조항의 명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허 일병 순직 인정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군 의문사 장병에 대한 명예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직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다른 유족들도 마음 편히 청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안웅엽 중령은 “법이 개정되면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들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