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지인의 눈에는 제주의 풀과 나무, 숲과 들이 모두 낯설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고 한라산 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오름 역시 그간 보아왔던 산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튼튼한 돌담을 두르고 있는 무덤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외지인의 눈에는 제주의 풀과 나무, 숲과 들이 모두 낯설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고 한라산 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오름 역시 그간 보아왔던 산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튼튼한 돌담을 두르고 있는 무덤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파내어도 끝없이 나오는 돌로 담을 쌓고 그렇게 하고도 남으면 어쩔 수 없이 한 구석에 쌓아두며 일구는 밭에 무덤이 있다. 구불구불한 밭담 안에 네모반듯한 무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밭 모양이 더 옹색하게 보인다. 대부분의 오름 한쪽엔 마을 공동묘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가까운 곳에 오름이 없는 마을에선 들 한가운데 공동묘지를 두고 있다. 멀리서도 잘 모이는 비석이 있는 문중묘지도 자주 보인다. 제주도의 장례 방식에 고민을 할 때가 된듯하다.
 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혈당 조절에 적합한 약을 선택하고 다른 건강 문제도 살폈다. 지루하고 암울한 연말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퇴원 후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 네 번째 이사였다. 부모님이 한평생 살았던 곳이고 내가 태어나 서른 살 무렵까지 살았던 곳이어서 살갑지는 않아도 마음 나눌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거리는 꾸준히 늘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실직 후 열 달도 채 되지 않아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혈당 조절에 적합한 약을 선택하고 다른 건강 문제도 살폈다. 지루하고 암울한 연말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퇴원 후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 네 번째 이사였다. 부모님이 한평생 살았던 곳이고 내가 태어나 서른 살 무렵까지 살았던 곳이어서 살갑지는 않아도 마음 나눌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거리는 꾸준히 늘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실직 후 열 달도 채 되지 않아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일 때문에 외출하는 경우도 없고 딱히 가야 할 곳도 없으니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이었다. 하루 세끼 식사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부모님에겐 하는 일 없이 앉아 시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였나보다. 어느 날 늦은 밤 두 분이 대화중에 ‘컴퓨터만 보고 앉아 있다’는 말이 들렸다. 하고 있는 일과 한 달 수입을 소상히 설명하고부터는 부모님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하루 2시간씩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주로 트레드밀에서 달렸다. 시작할 때는 3km 달리기도 버거웠는데 어느새 하루 7~8km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한 주에 평균 40km 이상을 뛰었다. 하프코스 마라톤에 도전에 1시간 37분을 기록하고 풀코스도 뛰었다. 일거리를 가리지 않은 덕에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번역을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일이 많아졌다. 실직 1년 만에 걱정거리라곤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제주도 서남단에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그리고 송악산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바닷가 풍경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마라도와 가파도를 보며 걷던 올레 코스도 모슬포항에서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을 향했다가 수월봉으로 내려와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안가의 지층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는 가까운 바다위에 떠 있는 차귀도를 보며 바닷가를 걸어 용수포구까지 간다.
제주도 서남단에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그리고 송악산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바닷가 풍경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마라도와 가파도를 보며 걷던 올레 코스도 모슬포항에서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을 향했다가 수월봉으로 내려와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안가의 지층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는 가까운 바다위에 떠 있는 차귀도를 보며 바닷가를 걸어 용수포구까지 간다.
 당산봉에 올라 바라보는 차귀도의 모습과 내려와서 만나는 바닷가의 길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용수포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수포구에서 올레 12코스가 끝나고 저지오름이 있는 중산간 지대로 향하는 13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간혹 배낭을 진 올레꾼들이 보일 뿐이다. 용수포구에서 열녀 고씨를 만난다.
당산봉에 올라 바라보는 차귀도의 모습과 내려와서 만나는 바닷가의 길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용수포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수포구에서 올레 12코스가 끝나고 저지오름이 있는 중산간 지대로 향하는 13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간혹 배낭을 진 올레꾼들이 보일 뿐이다. 용수포구에서 열녀 고씨를 만난다.
용수포구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보인다. 제주에서 이정도의 숲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용수포구 근처는 마을과 밭이 있을 뿐이어서 아름드리나무 옷을 입은 바위 언덕은 예사롭지 않다. 열녀 고씨의 이야기를 품은 엉덕동산이다.
 유교에서 중시한 덕목 가운데 열은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을 뜻한다. 조선시대에 여성에게는 충효와 함께 정절이 최우선 덕목이었다. 특히 여성의 정절은 초기엔 양반층 여성에 국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여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열녀문이 양반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면서 방방곡곡에서 남편 따라 목숨을 끊은 열녀가 한둘이 아니었다. 정조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화순옹주마저 열녀가 되었다. 제주도에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30여명의 열녀가 알려져 있다. 이곳 용수포구의 고씨 부인도 그 중 한 명이다.
유교에서 중시한 덕목 가운데 열은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을 뜻한다. 조선시대에 여성에게는 충효와 함께 정절이 최우선 덕목이었다. 특히 여성의 정절은 초기엔 양반층 여성에 국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여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열녀문이 양반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면서 방방곡곡에서 남편 따라 목숨을 끊은 열녀가 한둘이 아니었다. 정조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화순옹주마저 열녀가 되었다. 제주도에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30여명의 열녀가 알려져 있다. 이곳 용수포구의 고씨 부인도 그 중 한 명이다.
 조선시대 임자년 (1852년)에 용수리의 총각 강사철과 고씨 처녀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의좋게 살았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강사철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테우를 타고 차귀도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와 바구니 등을 만들어 팔며 알뜰하게 살았다.
조선시대 임자년 (1852년)에 용수리의 총각 강사철과 고씨 처녀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의좋게 살았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강사철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테우를 타고 차귀도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와 바구니 등을 만들어 팔며 알뜰하게 살았다.
 결혼하고 이듬해 11월 13일에 강사철은 동네 사람들을 따라 차귀도에 딸린 죽도에 가서 파도가 거세지는 줄도 모르고 땀흘리며 대나무를 베었다. 베어낸 대나무를 테우에 싣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만한 파도가 덮쳐 테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온데간데없어졌다.
결혼하고 이듬해 11월 13일에 강사철은 동네 사람들을 따라 차귀도에 딸린 죽도에 가서 파도가 거세지는 줄도 모르고 땀흘리며 대나무를 베었다. 베어낸 대나무를 테우에 싣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만한 파도가 덮쳐 테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온데간데없어졌다.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던 식솔들이 험해지는 파도를 보다 못해 포구 끝에 몰려나와 서 있는데 그 눈앞에서 테우가 엎어졌으니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파도가 워낙 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던 식솔들이 험해지는 파도를 보다 못해 포구 끝에 몰려나와 서 있는데 그 눈앞에서 테우가 엎어졌으니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파도가 워낙 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여러 식솔과 함께 이날 사라진 가족을 찾으러 다녔지만, 혼자였던 고씨 부인은 눈이 벌개지도록 남편 시신을 찾으러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온갖 곳을 다 다녔다. 짚신이 너덜너덜 해져서 발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 그날 테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시신을 다 찾았지만 강사철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여러 식솔과 함께 이날 사라진 가족을 찾으러 다녔지만, 혼자였던 고씨 부인은 눈이 벌개지도록 남편 시신을 찾으러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온갖 곳을 다 다녔다. 짚신이 너덜너덜 해져서 발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 그날 테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시신을 다 찾았지만 강사철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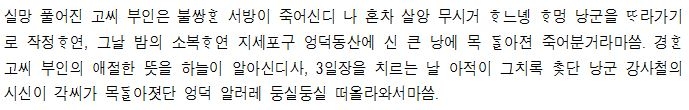
 마을사람들이 이 부부의 시신을 거두어 당산봉의 동쪽 비탈 밭에 합장했다. 이 사연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고씨 부인의 절개를 칭찬하였는데 관에서도 이를 알게 되어 대정판관 신재우가 이곳 엉덕동산의 바위에 ‘절부암’이라는 글귀를 새겨 후대에 그 뜻을 기리게 하고 매해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제민일보 2014년 2월 21일자 소설가 김창집의 제주어 전설 절부암 참조)
마을사람들이 이 부부의 시신을 거두어 당산봉의 동쪽 비탈 밭에 합장했다. 이 사연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고씨 부인의 절개를 칭찬하였는데 관에서도 이를 알게 되어 대정판관 신재우가 이곳 엉덕동산의 바위에 ‘절부암’이라는 글귀를 새겨 후대에 그 뜻을 기리게 하고 매해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제민일보 2014년 2월 21일자 소설가 김창집의 제주어 전설 절부암 참조)

기고 오근식 1958 년에 출생했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원도 인제에서 33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직해 근무하던 중 27살에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두 곳의 영어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인제대학교 백병원 비서실장과 홍보실장, 건국대학교병원 홍보팀장을 지내고 2019년 2월 정년퇴직했다.
[쿠키뉴스] 편집=이미애 trueald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