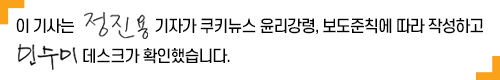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을 다룬 기획기사 [1.5평의 권리]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대학교 계단 밑 공간을 개조한 곳에서 청소 노동자는 쉽니다. 높이가 1m 50cm입니다. 낮은 천장 탓에 내부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합니다. 한 시간 남짓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하나 있는 창문은 흡연 구역 앞이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계가 30년 전에 멈춘 것 같습니다. LG그룹이 1995년 이름을 바꾸기 전 출시됐을 금성 냉장고, 얼핏 봐도 연식이 돼 보이는 전자 레인지와 커피 포트. 누군가 내놓은 물품 중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냄새가 심하지 않은 계란프라이와 김이 단골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휴게실 밖으로 음식 냄새가 나면 눈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실은 대게 각 아파트 동의 지하 공간입니다. 몇 년을 산 주민도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 경비원은 쉽니다. 지하 공간이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비원들은 초소 뒤편 화장실에서 숨을 돌립니다. 변기 옆에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이자 휴게실 그리고 부엌인 셈입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눈이라도 붙일 참이면 ‘자지 말라’면서 초소 창문을 두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이 쉬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경비원들은 스스로를 ‘파리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불청객입니다. 노동자들은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혹여 보도가 되어도, 관심은 반짝. 휴게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용 인원에 맞는 넉넉한 공간과 냉난방 시설, 창문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였죠.
열악한 휴게 공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아지기 어려운 걸까요.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이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학교, 아파트를 쓸고 닦죠. 언젠가는 이 일이 쿡기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 노동자는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인생은 70부터! 존경하는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거실 뒤편에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백설기, 과일, 케이크가 차려진 상 앞에서 ‘브이 자’를 하고 환히 미소 지은 한 남성. 기자가 만난 한 경비 노동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장 노동자들도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나아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5평의 권리]
①주차장, 창고, 트렁크…쉴 곳을 고른다면
②감옥에 갇히면 이런 기분일까
③왜 맨날 계란프라이만 싸 오냐고요?
④노동자 수백명, 휴게실 의자는 7개
⑤19명이 샤워실 앞에 줄을 섰다
[친절한 쿡기자]1.5평의 권리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