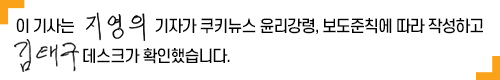고향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고향을 묻는 까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다. 고향이 단순히 하나의 지명에 그치지 않아서다. 고향이란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자고 일어나 문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주하는 날씨와 풍경, 토지, 오가는 사람들의 말씨와 문화가 고향을 이루는 요인이다. 그렇기에 고향을 안다는 것은, 상대가 살아온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일이 된다.
꼭 태어나서 오래 자란 곳이 고향일 필요는 없다. 마음을 붙이고 오래 지내와서 그립고 정든 곳이라면 그 곳이 당신의 고향이 된다. 대표적인 곳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서울이다. 수년 전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출생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고향으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5만명 가까이 되는 서울시민 중 80% 이상이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면서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고향으로 여기는 서울은, 매일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고, 이를 위해 기존 건물과 토지를 부수고 갈아엎어서다. 여러 도시 중에서도 옛 모습이 가장 남아있지 않은 땅이다. 신축 건물을 늘리고, 반듯한 계획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서울의 개발 과정을 보면 입이 쓰다. 오래되어 낡았다 해서 가차 없이 부수고 치워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서울을 개발한다는 이들이 부수는 공간들 중에는 사람들의 추억과 희노애락이 담긴 곳들이 많다. 최근 철거 위기에 놓인 충정로 한편의 철길 옆 떡볶이 가게도 그런 곳이다. 노부부가 구청에 토지 사용료를 내며 업장을 운영해왔다. 서울 시민들과 마주한 세월만 49년이다. 이곳은 최근 서대문구청의 도시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돼 철거될 위기다. 구청은 떡볶이 가게를 밀어내고 48평짜리 작은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떡볶이 가게 옆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낡은 건물 등도 녹지조성 사업 대상이었으나 제외됐다. 개인의 부동산을 부수긴 쉬워도, 정부 건물 철거를 강행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구청의 이 ‘선택적’ 도시계획 앞에 인근 직장인과 거주민, 학생들이 분노했다. 시민 636명이 철거 반대 청원을 냈다. 시민들은 오랜 시간 고향이 되어준 철길 떡볶이를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다. 철길 떡볶이를 운영하는 노부부도 용기를 내 싸우기로 했다. 철길 떡볶이 사건은 내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와 서대문구청에 묻는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계속 향유할 권리가 없는가. 고향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개발에 반영될 수는 없는가. 구청은 먼저 답했다. 도시계획은 이미 정해졌고,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니 시민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답을 줄 것인가.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