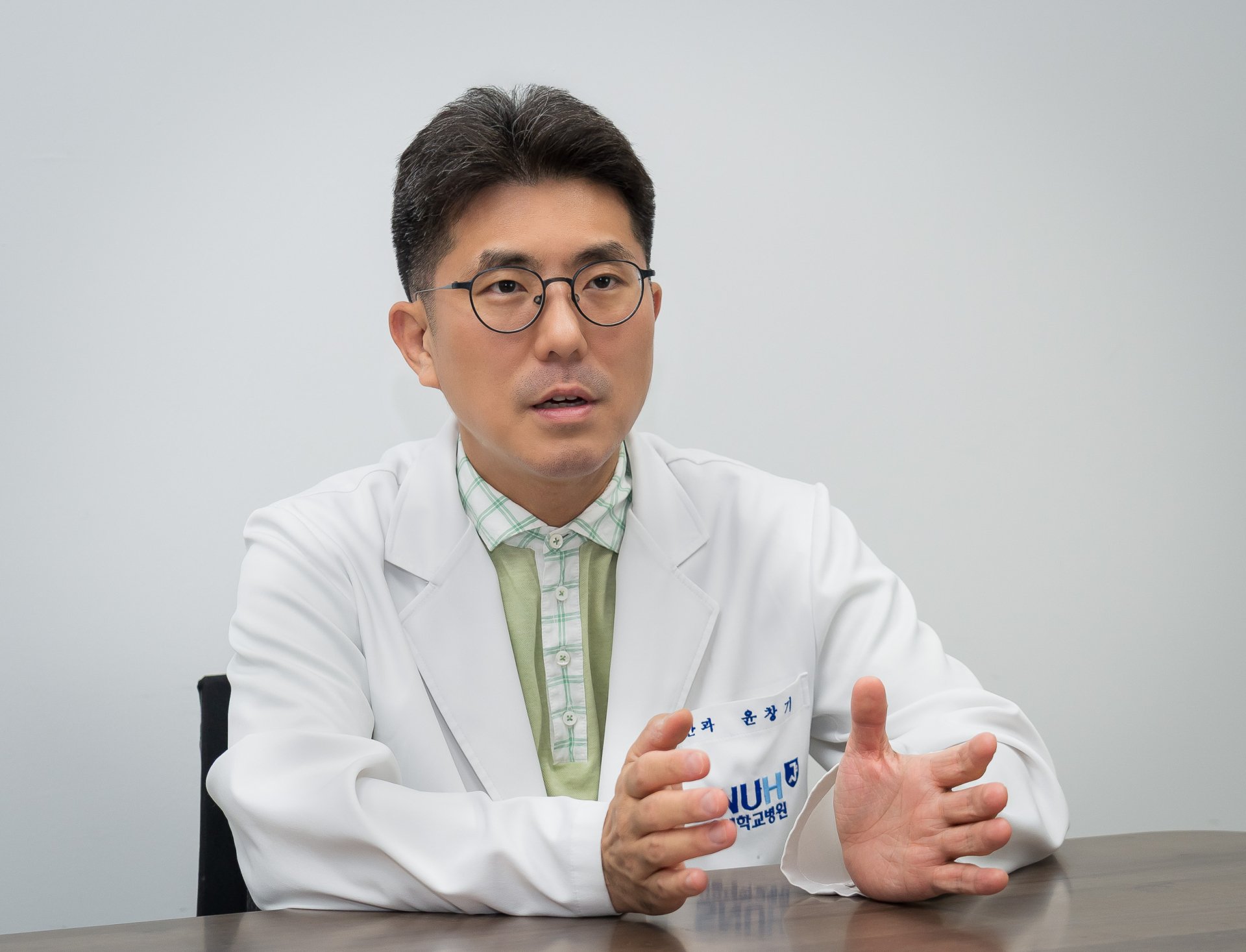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쿠키 스포츠]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등 빙속 3총사의 메달 전선에 빙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얼음의 상태가 과거 밴쿠버올림픽 때나 지난해 3월 소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빙질과 다르기 때문이다.
3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 빙상장에서 공식 훈련을 시작한 빙속 대표팀은 4일에도 트랙을 누비며 빙질을 몸에 익히는 데 주력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10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달라지는 민감한 경기여서 얼음판 등 빙상장의 환경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장거리 황제’ 스벤 크라머를 앞세운 네덜란드를 비롯해 각국 대표팀도 연일 빙질 적응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모태범이 욕심을 내는 1000m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흑색 탄환’ 샤니 데이비스(미국)는 일찌감치 지난달 31일 소치에 도착해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당초 아들레르 아레나의 빙질은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본적으로 얼음이 무르고 속도가 잘 나지 않아 밴쿠버 올림픽 오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원래 얼음이 무르면 그만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쉽고 역주를 펼치기 어려워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빙질 좋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캐나다 캘거리 빙상장에서 세계신기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로우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밴쿠버 올림픽 오벌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따냈던 빙속 3총사는 오히려 무른 빙질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난해 3월 아들레르 아레나를 경험했던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처음 링크에 들어선 순간 셋이 동시에 ‘밴쿠버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적응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첫 훈련 이후 빙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대표팀의 맏형 이규혁은 “경기장 빙질이 무른 편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상화는 반대로 “단단했다”고 답했다. 선수들은 과거 경험과 다른 느낌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외국 선수들도 빙질이 아리송하다는 표정이다. 한국팀에 앞서 훈련을 한 스벤 크라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때와는 빙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상화는 “지난해에는 느낌이 좋았는데, 올해는 올림픽이어서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다”면서 “너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얼음에 몸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케빈 크로켓 코치는 ‘이상하다(funny)’는 표현을 쓰며 “실전에서 또다시 빙질이 바뀔 수 있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빙속 대표팀은 8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열리는 남자 5000m에 이승훈이 첫 출전한다. 뜻밖의 빙질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금빛 질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소치=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3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 빙상장에서 공식 훈련을 시작한 빙속 대표팀은 4일에도 트랙을 누비며 빙질을 몸에 익히는 데 주력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10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달라지는 민감한 경기여서 얼음판 등 빙상장의 환경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장거리 황제’ 스벤 크라머를 앞세운 네덜란드를 비롯해 각국 대표팀도 연일 빙질 적응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모태범이 욕심을 내는 1000m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흑색 탄환’ 샤니 데이비스(미국)는 일찌감치 지난달 31일 소치에 도착해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당초 아들레르 아레나의 빙질은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본적으로 얼음이 무르고 속도가 잘 나지 않아 밴쿠버 올림픽 오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원래 얼음이 무르면 그만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쉽고 역주를 펼치기 어려워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빙질 좋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캐나다 캘거리 빙상장에서 세계신기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로우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밴쿠버 올림픽 오벌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따냈던 빙속 3총사는 오히려 무른 빙질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난해 3월 아들레르 아레나를 경험했던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처음 링크에 들어선 순간 셋이 동시에 ‘밴쿠버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적응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첫 훈련 이후 빙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대표팀의 맏형 이규혁은 “경기장 빙질이 무른 편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상화는 반대로 “단단했다”고 답했다. 선수들은 과거 경험과 다른 느낌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외국 선수들도 빙질이 아리송하다는 표정이다. 한국팀에 앞서 훈련을 한 스벤 크라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때와는 빙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상화는 “지난해에는 느낌이 좋았는데, 올해는 올림픽이어서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다”면서 “너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얼음에 몸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케빈 크로켓 코치는 ‘이상하다(funny)’는 표현을 쓰며 “실전에서 또다시 빙질이 바뀔 수 있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빙속 대표팀은 8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열리는 남자 5000m에 이승훈이 첫 출전한다. 뜻밖의 빙질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금빛 질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소치=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