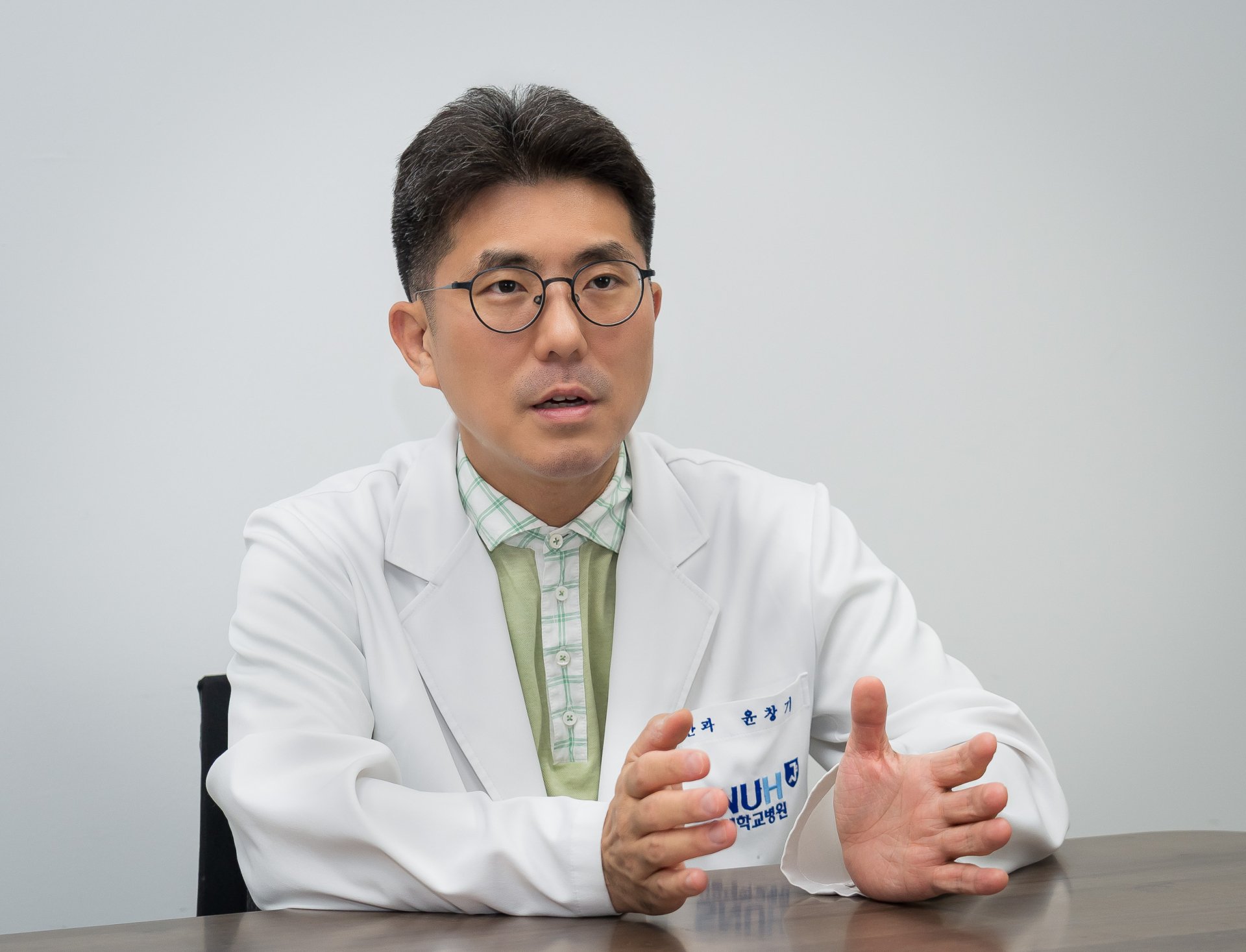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쿠키 스포츠] 소치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4년전 밴쿠버올림픽에서 11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뒤 인프라 구축과 선수 육성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온 만큼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3기 집권과 맞물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순위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좌우하는 문제다.
그래서일까. 대회 초반부터 러시아의 홈 텃세가 만만치 않다. 러시아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로 막을 내린 피겨 단체전은 막강한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신설된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캐나다는 결국 러시아에 밀려 은메달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단체전 여자 싱글의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 모두 출전한 율리아나 리프니츠카야의 점수만 봐도 러시아의 홈 어드밴티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리프니츠카야는 9일(한국시간) 쇼트에서 기술점수(TES) 39.39, 구성점수(PCS) 33.51을 기록해 종합점수 72.90점으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70.8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0일 프리에서도 기술점수(TES) 71.69점, 구성점수(PCS) 69.82점을 받아 141.51점으로 그레이시 골드(미국·129.38점)를 여유 있게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쇼트와 프리에 모두 출전한 리프니츠카야의 점수는 무려 214.41이다.
리프니츠카야는 쇼트와 프리 둘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3x2)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롱에지(잘못된 스케이트날 사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점프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트리플 러츠 점프와 트리플 플립 점프는 롱에지 판정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피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에 비해 프리 2위를 차지한 그레이시 골드(미국)의 경우 리프니츠카야보다 트리플 컴비네이션 점프를 비롯해 다른 점프의 비거리가 높고 착지까지 훨씬 좋았는데도 가산점이 훨씬 적었다.
또한 리프니츠카야는 스케이팅 기술, 동작의 연결, 연기, 음악에 대한 이해와 안무 해석력 등 예술성을 평가하는 5개 항목(각각 10점 만점)의 구성점수 역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았다. 쇼트 2위를 차지한 코스트너가 매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점수가 리프니츠카야보다 겨우 1.40점 높은 34.92점이었다. 한마디로 심판들이 리프니츠카야에게 점수를 퍼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자 싱글 외에 피겨 단체전의 다른 종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피겨는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피겨 단체전이 진행되던 지난 9일 프랑스 스포츠전문지 레퀴프는 러시아와 미국 심판이 손을 잡고 서로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피겨의 이런 특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구성점수는 심사위원에 따라 상당히 갈리는데다 기술점수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홈 텃세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의 가장 큰 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연아는 오는 12일 소치에 입성해 20일 여자 싱글 쇼트와과 21일 프리에 출전한다.
러시아의 홈 텃세가 예상되는 것은 피겨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메달밭으로 꼽히는 쇼트트랙은 자리싸움이 격렬하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 때문에 승부가 바뀌기도 한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당시 남자 1500m에서 김동성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을 인정한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실격을 당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안현수를 귀화시켜 첫 쇼트트랙 금메달을 노리는 러시아가 심판 판정에 홈 텃세를 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소치=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그래서일까. 대회 초반부터 러시아의 홈 텃세가 만만치 않다. 러시아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로 막을 내린 피겨 단체전은 막강한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신설된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캐나다는 결국 러시아에 밀려 은메달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단체전 여자 싱글의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 모두 출전한 율리아나 리프니츠카야의 점수만 봐도 러시아의 홈 어드밴티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리프니츠카야는 9일(한국시간) 쇼트에서 기술점수(TES) 39.39, 구성점수(PCS) 33.51을 기록해 종합점수 72.90점으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70.8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0일 프리에서도 기술점수(TES) 71.69점, 구성점수(PCS) 69.82점을 받아 141.51점으로 그레이시 골드(미국·129.38점)를 여유 있게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쇼트와 프리에 모두 출전한 리프니츠카야의 점수는 무려 214.41이다.
리프니츠카야는 쇼트와 프리 둘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3x2)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롱에지(잘못된 스케이트날 사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점프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트리플 러츠 점프와 트리플 플립 점프는 롱에지 판정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피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에 비해 프리 2위를 차지한 그레이시 골드(미국)의 경우 리프니츠카야보다 트리플 컴비네이션 점프를 비롯해 다른 점프의 비거리가 높고 착지까지 훨씬 좋았는데도 가산점이 훨씬 적었다.
또한 리프니츠카야는 스케이팅 기술, 동작의 연결, 연기, 음악에 대한 이해와 안무 해석력 등 예술성을 평가하는 5개 항목(각각 10점 만점)의 구성점수 역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았다. 쇼트 2위를 차지한 코스트너가 매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점수가 리프니츠카야보다 겨우 1.40점 높은 34.92점이었다. 한마디로 심판들이 리프니츠카야에게 점수를 퍼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자 싱글 외에 피겨 단체전의 다른 종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피겨는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피겨 단체전이 진행되던 지난 9일 프랑스 스포츠전문지 레퀴프는 러시아와 미국 심판이 손을 잡고 서로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피겨의 이런 특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구성점수는 심사위원에 따라 상당히 갈리는데다 기술점수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홈 텃세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의 가장 큰 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연아는 오는 12일 소치에 입성해 20일 여자 싱글 쇼트와과 21일 프리에 출전한다.
러시아의 홈 텃세가 예상되는 것은 피겨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메달밭으로 꼽히는 쇼트트랙은 자리싸움이 격렬하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 때문에 승부가 바뀌기도 한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당시 남자 1500m에서 김동성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을 인정한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실격을 당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안현수를 귀화시켜 첫 쇼트트랙 금메달을 노리는 러시아가 심판 판정에 홈 텃세를 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소치=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