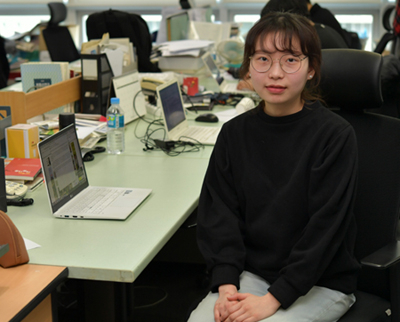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만들기 교실이 열렸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챙겨 가야할 만들기 준비물은 무엇일까. 풍부한 백신 플랫폼,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 연구 지속을 위한 투자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완성작을 들고 교실을 나서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협업이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만들기 교실이 열렸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챙겨 가야할 만들기 준비물은 무엇일까. 풍부한 백신 플랫폼,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 연구 지속을 위한 투자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완성작을 들고 교실을 나서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협업이다.
백신 만들기 교실은 장기 과정이다. 수료하려면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린다. 머크(Merck)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상용화까지 17여년이 걸렸다. GC녹십자의 B형 간염 백신 ‘헤파박스B’는 11년의 연구 끝에 출시됐다.
백신 만들기 교실은 참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바이러스를 확보해 기작을 밝히고, 이를 활용해 백신 후보 물질을 설계한다. 후보물질은 전임상·임상 1~3상을 거치며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임상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대량생산도 필수다. 전 과정에는 최대 2조원까지 투입된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에 수조원을 쏟아 부어 보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중간에 빈손으로 교실을 뛰쳐나가는 도전자들도 많다. 지난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당시 여러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감염 확산세가 빨리 진정돼 백신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불확실해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분산됐고, 메르스 백신의 근황을 전해온 기업은 없다.
운이 나쁘면 만들기 교실이 뜻밖에 폐강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는 백신을 기다려줄 정도로 사려 깊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출몰한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의 백신은 2003년부터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을 전후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연구·개발에 몰두하다 정신차려보니 바이러스가 소리 소문 없이 자연 소멸했다.
이쯤 되면 백신 만들기 교실은 비인기 강좌일 것이 뻔하다. 길고 지루한데 비싸고 난이도가 높기까지 하다. 백신 개발을 전적으로 민간 부문과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같은 대규모 비영리 민간 기금의 투자가 지속적 연구·개발을 가능케 한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기업, 학계, 연구기관의 공조도 백신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강좌를 독강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그러나 천재 아닌 범재들도 십시일반 노트 필기와 기출문제를 나누면 무사히 완강할 수 있다. 지구촌은 인종·국적·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감염병의 위협을 대면하고 있다. 단일 조직이 오롯이 혼자만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백신을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계선을 무시하고 덮쳐 오는 악당에게는 경계선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응수하는 것이 해법 아닐까.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