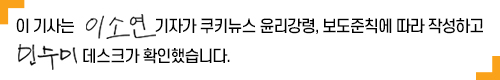A씨가 일하던 곳은 경기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이다. 완성된 종이상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면서 인쇄, 묶음, 리프트 적재 등의 공정을 거친다. A씨는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현장 동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오전 3시35분까지는 문제없이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종이상자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리프트에 끼인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리프트쪽으로 몸을 집어넣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 상태로 켜져 있던 기계가 A씨를 물건으로 인식해 들어 올린 것이다.
A씨는 베테랑이었다.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만 20년 가까이 일했다.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는 매월 성적표가 붙었다. 같은 계열사 다른 공장의 생산량을 비교해 공지했다. 이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A씨는 주변에 “생산량을 늘리라고 재촉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휴식 1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업무 재개 10분전부터 기계를 돌렸다.
업무 환경도 고단했다. A씨의 노동시간은 주 55시간이었다. 사고가 난 주는 야간근무였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A씨의 회사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공장 내 CCTV가 있었지만 A씨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 CCTV에 담긴 영상은 공장 내 사무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전 4시, 사무실 인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이를 지켜볼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은 A씨가 사라진 후 30여분이 지난 뒤에야 비상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지청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점검 감독이 진행될 것이다.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사고 경위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사고와 관련해 계속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