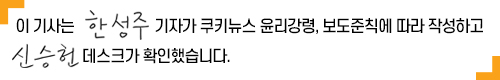지방 소도시가 뇌졸중 위험에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을 바로잡아 적시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뇌졸중 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 및 뇌졸중센터 현황’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학회 이사장)은 “뇌졸중은 국민 사망원인 질환 4위인데, 환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뇌출혈)으로 구분된다.
국내 인구 가운데 뇌졸중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복 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연간 약 10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42.6%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78%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고령화가 심화할 수록 환자 수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뇌졸중은 신속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 후유장애가 상당하다. 몸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 환자의 이송이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사망 확률이 10%씩 올라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사회경제적 부담도 동반한다. 이 교수는 “어제까지 돈을 벌면서 스스로의 생계 또는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을 쓰면서 오랜 시간 치료와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신속한 치료가 어렵다는 점이다. 뇌졸중 환자는 일반 응급실과 구분되는 뇌졸중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긍정적인 예후를 담보할 수 있다. 뇌졸중센터는 급성 환자에게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확보한 인증기관이다. 국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2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됐다.
치료 환경의 지역별 편차도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 환자들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뇌졸중센터의 수도권 분포는 57.1%다. 나머지 40% 가량이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44.6%가 처음 찾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치료 기회조차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뇌졸중은 고령층에서 빈발하는데, 초고령화 지역으로 꼽히는 지방에 뇌졸중을 적시에 치료할 곳이 없는 역설적인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전문의료인력과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뇌졸중 센터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가를 개선해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해소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개로 집계됐다. 학회는 2018년부터 뇌졸중 센터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로 인증된 기관은 54곳에 불과하다. 2017년 신설된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약 13만~15만원으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병실료보다 낮다.
병원 전단계부터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해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강지훈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병원전단계 위원장)는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도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가 상이하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절한 이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전단계부터 신경과 전문의들과 구급대원들을 연결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참여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차재관 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학회 질향상 위원장)는 “지자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가까운 센터와 119를 연계해 환자 이송 체계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데,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마다 큰 센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와 상관 없이 적절한 기능과 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센터를 두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