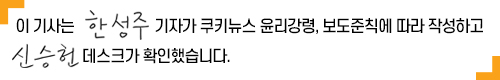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수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기업 간 협업으로 기술을 혁신하는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시류에 따라 기술수출도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완성해 출시하는 단계까지 밀고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수출은 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해외 기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벌어들이는 거래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국내 기업이 물질에 대한 권리를 해외 기업에 이전하고, 개발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수령하는 모습으로 이뤄진다.
기술수출은 국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주요 사업활동으로 꼽힌다. 기업이 보유한 품목에서 매출 성장이 없더라도, 마일스톤을 수령하면 분기보고서에 매출로 인식돼 두드러지는 실적 향상을 뽐낼 수 있다. 가령 사노피에 파킨슨병 등 퇴행성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ABL301’를 기술수출한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달 15일 공시를 통해 사노피로부터 마일스톤 2000만달러를 수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달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화 285억1600만원으로, 에이비엘바이오의 지난해 매출 5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바이오 벤처뿐 아니라, 업계 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 상위 기업들도 기술수출에 열을 올린다. 이달 15일 동아ST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이하 뉴로보)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ST는 현재 개발 중인 2형 당뇨병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26’의 전세계 독점 개발권을 뉴로보에 이전한다. 동아ST가 받는 계약금은 2200만달러, 향후 수령 가능한 마일스톤은 최대 3억1600만달러다.
다만 기술수출이 마냥 수익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임상시험 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 차질이 생기면, 기술수출 계약의 양 당사 기업에게 모두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를 받은 기업이 사정에 따라 더는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 없거나, 개발 가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상품을 환불하듯, 후보물질을 도로 무르는 ‘권리반환’이 이뤄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미약품이다. 앞서 2011년부터 총 10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발 중단과 권리반환 사태로 고전했다. 앞서 2011년 아테넥스와 계약한 항암제 ‘오락솔’이 개발 중단됐다. 2015년 일라이릴리와 계약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 베링거인겔하임 및 자이랩 등과 계약한 항암제 ‘올무티닙’, 사노피와 계약한 당뇨병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얀센과 계약한 당뇨병 치료제 ‘HM12525A’ 등 총 5건은 권리반환됐다.
기술수출이 아닌, 제품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후보물질을 끝까지 개발해 제품으로 출시하는 사례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약을 가지게 되면, 기술수출로 벌어들이는 몇 차례의 마일스톤보다 지속가능한 대규모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이사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해외 기업의 목적이 제품 완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파이프라인이나 기술 선점을 의도하는 경우, 신약 후보물질을 더는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내에는 신약의 제품화까지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른 제약바이오 기업이 드물다”며 “정부가 초기 재원을 골고루 분산해 지원하고, 제품화 가능성을 보이는 사례에 선택·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