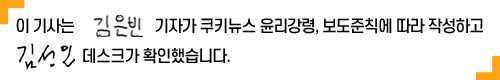4명 중 3명은 병원 안에서 죽음을 맞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익숙한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15.6%에 불과하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에선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있음에도 방문요양(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공 기관은 38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탓에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환자의 0.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 및 전문완화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국 환자·보호자들은 요양병원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돌보기 힘든 노인은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해괴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요양원은 노인장기오양보험이 적용된다. 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 수술 이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탓에 장기요양등급 없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의 수요가 늘고 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은 수요보다 병상을 2.5배 이상 갖고 있다”며 “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자에 투입되는 돈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투입되는 돈의 2배 정도다. 요양병원 병상이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지역돌봄 필요 노인 약 11%로 확대 △요양병원의 급여비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 △노인 재택의료서비스와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에 가정임종급여를 신설하고, 대상자를 말기암 환자에서 비암성질환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시군구 중심으로 가정형 호스피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인구 6만명당 1개의 재택의료기관과 인구 1만명당 1개의 통합재가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박 교수는 “사실 시범사업 대상자가 말기 암 환자에 국한돼 있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기 어렵다”며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노인성질환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가진 병동만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병원 입장에선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병원 입장에선 이용자가 적은 호스피스 병동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제도다”라며 “고려대구로병원만해도 병동을 축소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오동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 통합돌봄추진단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