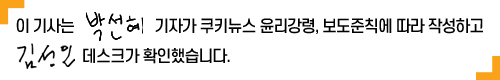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에 대한 선별 급여가 적용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기를 도입하는 경향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정맥 같은 증상이 없어도 기기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권 대학병원 교수는 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는 심장 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환자가 착용하기 편리해 활용도가 커지고 있지만 수가 확대와 선별 급여 반영 이후 남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심전도 측정은 예방,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 소견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진단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차원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데도 연령이 높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자에게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를 권유하는 의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웨어러블 심전도는 심장질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유용한 기기로 급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급여만 적용된다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 리듬을 확인하는 의료기기로, 홀터 기록(Holter Monitoring) 검사라고도 불린다. 기존 심전도 검사는 병원에서만 가능했고 24시간만 기록할 수 있어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부정맥을 제대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최근 개발된 웨어러블 심전도는 3~7일(최장 14일) 일생상활을 하며 심장 리듬을 기록할 수 있는 가슴 부착형(패치형) 의료기기로,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부가 24시간 검사한 행위에 한해 수가를 인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값비싼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해 사용하기엔 부담이 컸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 기록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로 세분화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행위 수가 범위는 최대 14일까지 확대했다. 보험수가도 기존 5만원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20만원까지 늘었다. 환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선별 급여로 처방 받을 수 있다.
수가 신설에 따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들은 심전도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처방량은 증가세를 그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8시간 초과 7일 이내 심전도 검사’를 이용한 환자 수는 489명(처방액 7109만원)에 그쳤는데 6월 들어 2075명(3억211만원), 10월 3590명(5억2436만원)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수가 신설에 따른 소요 재정을 연간 24억~49억원 정도로 측정했지만,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처방량을 고려하면 예상 재정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12월 심전도검사를 두고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심전도 웨어러블의 경우 검사 편의성, 질병의 조기 발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고 사용량 증가가 예측된다. 급여에 대해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선별 급여 적용 3년 뒤 재평가하도록 권고했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의료계와 국민 인식에서 웨어러블 심전도는 임상적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다만 기술 특성상 남용 가능성이 있어 재정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 향후 급여 적용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급여 기간 내 비용효과성은 결국 환자 치료로 이어진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즉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측정으로 부정맥 환자가 얼마나 발견됐고, 실제 치료로 이어졌는지가 중점이 된다”며 “3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등재가 될 땐 수가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