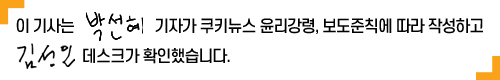“이야, 여기서도 제약사가 악당이야?” 최근 OTT플랫폼 넷플릭스 시청에 심취해 있던 기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유독 제약사가 빌런(villain, 악당·악역)인 창작물이 많을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의 사명과 달리 어째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무엇을 감추거나 속이고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전락하는 걸까.
올해 3월 개봉한 영화 ‘웅남이’에서는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범죄 조직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깡패 집단인 거죠. 중국에 일부러 괴질을 퍼트리고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해 큰 수익을 창출하려는 악질로 등장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개봉한 영화 ‘늑대사냥’에서는 어마어마한 완력과 순발력, 내구력을 가진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 괴물 역시 ‘이온제네틱스’라는 제약사와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존제네틱스는 정부 몰래 외국으로부터 괴물을 빼내오는가 하면 허가 받지 않은 임상실험을 반복하면서 괴생명체를 인간 병기로 활용할 목적을 드러내죠.
이런 경향은 외국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돕식: 약물의 늪’이라는 영화는 ‘중독될 확률 오직 1%’라는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모두를 마약 중독에 빠트린 거대 제약사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 ‘스위트걸’은 암에 걸린 아내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복제약이 대형 제약사의 독점으로 출시가 미뤄지는 내용을 담았죠.
실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악역 이미지로 그려지는 게 슬프지만 이해는 된다고 말합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고 만드는 기업이자 그 약을 팔아 이윤을 갖는 기업이기도 해요. 병에 걸려 아파하는 혹은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결국 돈을 받고 약을 제공하죠. 돈이 없으면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 등장할 만한 가장 적당한 빌런 아닐까요”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제약업계는 욕을 참 많이 먹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제때 생산·공급하지 못해서, 약값이 비싸서,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주가를 올리지 못해서, 임상에 실패해서 등등. 약을 둘러싼 일희일비한 문제들이 툭하면 제약사에게 화살을 돌려 순식간에 진짜 악당이 돼 버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잘못이 있든 또 그렇지 않든 그들은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신약 개발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이어가기 힘든 사업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투자,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성공하더라도 질환에 따라 환자 수가 너무 적거나 약값이 낮아 수익성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품 생산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죠.
제약사가 만들어낸 신약은 그간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켰지만, 정작 부응하는 신뢰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이미지에 힘이 실리는 것은 생명이 갖는 무게가 큰 만큼 윤리적으로 져야할 책임감 역시 막중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는 영화 속 세상과 다르게 다수의 제약사들은 오늘도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를 꿈꿉니다. 화학무기가 아닌 질병과 싸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값을 높이기보다 동정적 프로그램(EAP), 위험분담제 등을 전개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늘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에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언젠가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세월을 바쳐 세상을 구한 중소제약사가 히어로로 등장하는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