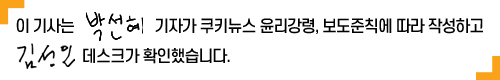# 강미현(가명·33세)씨는 최근 피부 발진이 심해져 직장이 있는 서울 강남역 인근 피부과를 다녀왔지만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강씨가 찾은 의원 5곳 모두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는 안 한다’고 했다. 강씨는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만 한다면서 진료를 거부했다”며 “하나 같이 간판에 ‘피부과’라고 써 있는데 진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진, 두드러기가 생겨 동네 피부과를 방문했다가 피부질환 진료를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피부과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간판 등에 꼼수를 부리는 의원들이 늘면서 환자들의 혼란은 줄지 않는다. 제도를 정비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기준 1279개였던 피부과 의원 수는 2023년 3분기 1430개로 11.8%(151개) 증가했다. 그러나 피부질환 진료·치료가 가능한 곳은 오히려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피부과’와 ‘클리닉’ 등의 명칭을 분명하게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달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피부 아픈 환자를 안 보는 피부과는 피부과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글엔 ‘발진 나서 피부과를 갔더니 의사가 미용 위주로 한다며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 ‘전문의 병원 찾아갔더니 다이어트약 받으러 왔냐고 물어보더라. 대체 ’찐‘(진짜) 피부과는 어떻게 구분하나’, ‘번화가에 있는 피부과는 다 미용하는 손님만 받더라’, ‘미용 시술 말고 진료도 보는 피부과인지 검색하고 확인까지 해야 한다’ 등 불편을 겪은 경험담이 줄줄이 댓글로 붙었다.
피부과는 피부질환 진료를 아우르는 ‘피부과 의원’과 보툴리눔톡신, 필러 등의 에스테틱 시술을 위주로 하는 ‘클리닉’으로 나뉜다. 두 곳 모두 간판에 ‘피부과’를 달아 홍보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지난 2021년 피부질환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53.1%는 피부질환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 의원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의 자격 구분, 전문의 의원 간판 구분 등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오답률이 각각 76.8%, 72%에 달했다.
학회는 전문의가 아닌 일부 일반의 의원이 의료법이 규정한 간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최○○ 피부과 의원’이라는 명칭은 최○○ 의사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는 ‘최○○ 의원(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해야 한다. 진료과목 표기를 빼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간판을 제작하는 등 불법·편법 행위를 통해 환자들에게 착각을 주는 일반의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강남 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 A씨는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에스테틱이나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피부질환 치료로는 돈벌이가 안 된다. 일반의와 전문의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시술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은 총 979곳이었다. 이중 86%에 해당하는 843곳이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신고했다.
방찬일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는 “최근엔 일반의로 개원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일반의는 피부질환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에 제한이 있다”면서 “의원에서 쓸 장비를 구입할 때 판매업자 등에게 배운 작동법에 따라 미용 시술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회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 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의에 이어 일반의 사이에서도 피부과 같은 비필수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단속이나 처벌이 갈수록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서울 서초 지역 피부과 원장 B씨는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더라도 규정을 어긴 채 운영하는 편이 더 이익이라고 보는 원장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간판을 살피는 일도 한계가 있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