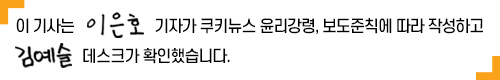피로 자유를 찾은 기억은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근현대 민중 혁명의 시작을 알린 프랑스 혁명은 예술을 통해 끝없이 재해석됐다. 한국도 시민들의 피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그래서일까. 4·10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두 편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올해 한국공연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와 8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다. 소재는 비슷해도 시선은 다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에 악녀로 기억된 왕비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레미제라블’은 사랑과 희망에 무게를 둔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지” 이 말을 한 사람은…
단두대에서 참수당한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그는 프랑스 백성에게 마녀로 통했다. 사치를 일삼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진실은 다르다. 국고는 선대 루이 14세 때부터 바닥을 드러냈다. 굶주린 백성을 향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한 이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비에게 씌워진 거짓 혐의를 벗겨낸다. 왕비는 당시 프랑스와 사이가 나빴던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다. 후계자를 낳기 전까진 귀족에게도 무시당했다. 세간엔 왕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지라시’가 퍼졌다. 뮤지컬은 왕비를 둘러싼 가짜 뉴스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에 주목한다. 관객은 혁명군이 아닌 마리 앙투아네트에 이입해 감정의 굴곡을 느낀다.
혁명 최전선에 선 마그리드 아르노는 뮤지컬에만 나오는 가상 인물이다. “저 여잔 우리 왕비 아냐”라며 마리 앙투아네트와 대립한다. 혁명을 다룬 뮤지컬에서 흔히 볼 법한 캐릭터는 아니다. 권력을 탐하는 오를레앙 공작의 속임수에 넘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 이런 그에게 스웨덴 출신 귀족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뭔가 뺏긴 것처럼 느껴/ 막연한 증오가 되죠”라고 노래할 때 관객은 코웃음이 난다. 착취당한 민중의 분노를 질투와 열등감으로 축소하는 듯해서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전 겪었을 소외감보단 그와 귀족의 로맨스에 더 치중한 점도 아쉽다. 인물마다 감정의 진폭이 커 배우들의 열연을 감상하기엔 제격이다. 대극장에선 보기 드문 여성 투톱 뮤지컬이기도 하다. 한국공연은 이번 시즌 이후 재정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5월26일까지 서울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이어진다.

“관객에게 질문 던지는 심정으로”…그 노래의 전율 다시 한번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투쟁이 벌어지는 곳 어디서든 소환되는 노래 ‘두 유 히어 더 피플 싱’(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통해서다. 작품은 ‘마리 앙투아네트’ 속 프랑스 대혁명 40여년 후를 그린다. 빵 하나를 훔쳐 19년간 징역살이를 한 장발장을 중심으로 당시 프랑스 시민들의 비참한 삶을 조명한다. 장발장은 옥살이를 끝내고도 방황한다. 가슴팍에 새겨진 범죄자 낙인 때문이다. 세상을 저주하던 그는 미리엘 신부의 자비를 경험한 후 달라진다. 자신이 받은 너그러움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억울하게 죽은 판틴의 딸 코제트를 입양하고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임을 깨닫는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인류를 향한 작가의 애정과 낙관이 돋보인다. 위고는 1832년 6월 혁명을 배경으로 ‘레미제라블’을 썼다. 당시 프랑스는 혼란스러웠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탄생한 제1공화국은 단명했다. 나폴레옹 실각 이후엔 왕정이 다시 들어섰다. 6월 혁명은 왕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일으킨 봉기다. 역사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됐으나 뮤지컬은 희망의 씨앗을 남겨둔다. 혁명군 마리우스가 그 상징이다. 마리우스는 총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장발장 덕분에 살아남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망자들이 모여 ‘두 유 히어 더 피플 싱’을 부르는 장면은 눈물샘을 자극한다. 판틴을 연기한 배우 조정은은 “창작진은 이 노래로 관객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던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연은 지난 10일 끝났으나 오는 21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다시 막을 올린다. 대구 공연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