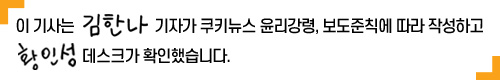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권 침해와 인권 보호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양상이다.
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운전기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정과 가사사용인이 자율적으로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결정하고, 양측이 사적으로 계약한다. 3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노동권 침해’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노동법 적용 기준이나 인권 보호 장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가정은 사적 공간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 착취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이를 감시하거나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시는 제도 시행과 성과에만 몰두하며, 정작 보호 시스템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는 일부 중산층의 편의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나 보호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긴급 신고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시 효과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선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권 침해 등의 포커스가 외국인 노동자에 맞춰져 있지만 내국인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의제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 법무부 지침에 맞춰 시도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가격은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을 훌쩍 넘긴 상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사사용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28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9860원)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최저임금 우회 등의 방식으로 노동 시장을 왜곡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해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제도 도입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