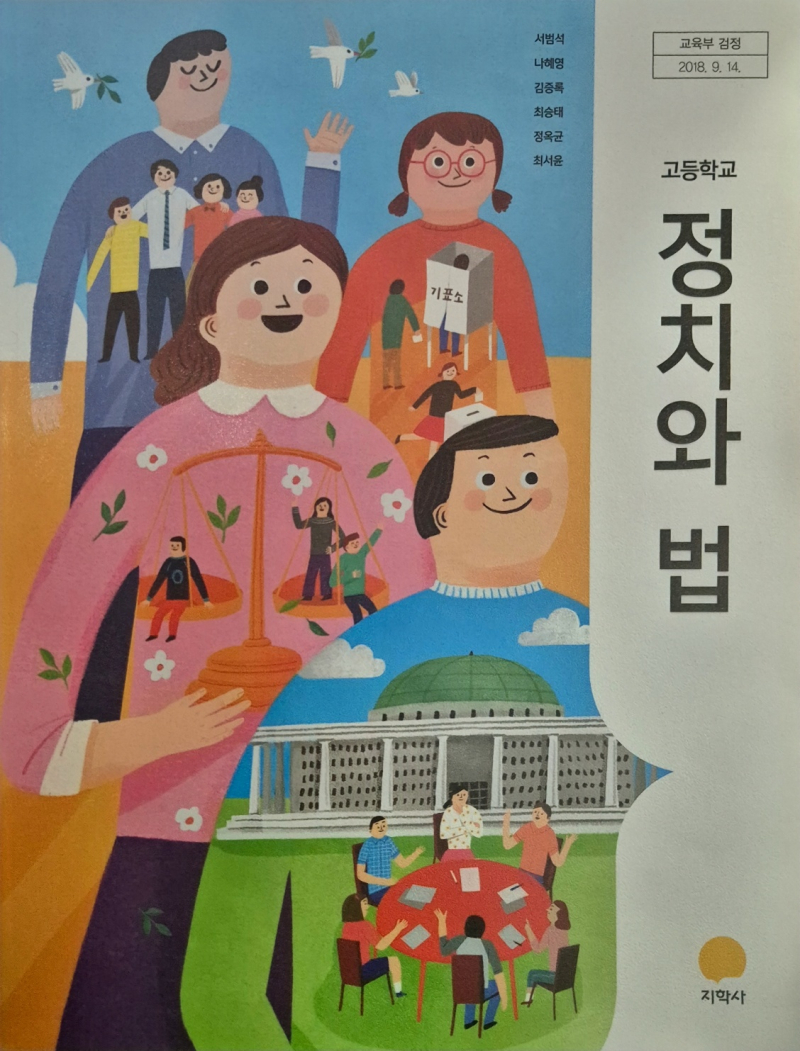
“국가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브레이크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은, 그 브레이크가 이제야 작동한 듯한 느낌을 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것도 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법은 단지 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와 여론의 흐름까지 뒤흔든다. 선거는 주권자의 시간이어야 한다. 교과서에서도 말하듯, 권력 간 견제는 필요하나 각자의 영역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균등한 선거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의 취지이기도 하다.
법은 스스로 공정하다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보기에도 공정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고법이 하루 만에 첫 공판을 잡았을 때, 많은 시민은 과정에 의문을 품었다. 6만 쪽이 넘는 기록, 단 두 차례의 평의, 이례적인 재판 일정.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인식을 낳은 건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방식이었다.
교과서들은 또 이렇게 설명한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만에 하나 법이 정치 위에 서야 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 위에 세워진 중립이어야 한다.
사법이 한발 물러섰다면, 이제 정치가 한발 자제할 차례다. 정치가 사법을 향해 탄핵을 외치고, 사법이 정치의 ‘타이밍’에 맞춰 판결 일정을 짜는 모습은 온전한 견제와 균형이라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바로 7일,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강행했다. 정치가 사법의 자제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입법 권한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순간, 균형은 깨진다.
기본을 잊었다면, 교과서부터 펼쳐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