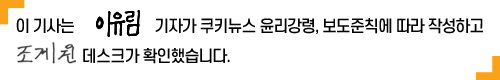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곳에는 30억원의 과징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을 현재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에서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3%, 2023년 51%, 2024년 47%로 산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이익의 5%를 건설사에 적용해 보면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4031억원으로 5%인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709억원으로 약 135억원, GS건설의 영업이익은 2860억원으로 143억원, 포스코이앤씨의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31억원이 부과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그렇다고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늘어나면 사망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해서 사고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들은 안전 분야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2773억원, 대우건설은 1351억원, DL이앤씨는 983억원을 안전비용으로 투자했다. 더불어 전 사원 대상 안전 교육 확대, 경영진의 현장 점검, 외국인 근로자 맞춤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안전 강화 조치도 시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조치와 함께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공기)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이번 방안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건설 사업 환경이 어렵거나 (당장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적정 공기와 공사비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이번 방안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노동 생산성과 기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