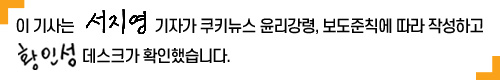정책은 서류로 머물 때보다 현장에 있을 때 더 빛을 발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은 지금 서울 곳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만남과 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립의 시간을 딛고 이웃의 손을 잡은 중장년 활동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다시 사회로 나서는 청년,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상담사. 외로움을 다루는 도시의 실험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세 현장을 찾아, 관계가 피어나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지금은 대화할 때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무 5주 차, ‘모두의 친구’ 활동가 이상열씨는 이렇게 말했다. 활동가로 일하기 전 그는 주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게 되면서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서울마음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다.
이씨는 “원래 사람 좋아하는 성격인데 혼자 살다 보니 만날 사람도 줄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더 하소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를 문밖으로 꺼내준 건 복지관 사회복지사였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때 도와준 복지사 선생님이 활동을 권해 주셨고, 취지도 좋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들르는 데가 바로 이곳, 마음편의점이다. 이씨는 “다양한 주민분들이 오는데 보통 외로워서 오신다”며 “어르신들께 건강은 어떠신지,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등을 여쭙는다”고 했다.

근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다. 복지관 공익요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활동가 2명과 함께 일한다. 이씨가 상담을 맡는 동안, 다른 두 명은 각각 방문자 명부 작성을 돕거나 라면 등 음식을 나른다.
활동 초반이지만 인상 깊은 사람도 있다. 이씨는 “하루 세 끼를 다 드시냐고 물으니 속이 안 좋아 한 끼밖에 못 드신다고 한 분이 계셨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 더 기억난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보통 어르신들은 시시콜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진심으로 말을 걸면 다 답해준다”며 “귀찮다고 가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를 만나는 동안 마음편의점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어 좋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좋지만 나오니 스트레스가 주는 것 같다” “다리가 불편한데 경로당은 멀고 좌식이라 불편해서 여길 주로 온다”고 했다.
활동가로 일하며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로운 사람들이 용기 내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아프지 말고 건강히 행복하게 삶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곳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아서요. 다 포기하고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서울연결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A씨의 말이다. 서울청년센터 성북점에서 만난 그는 ‘사회생활 연습실’ 콘텐츠를 통해 더 나은 직장과 조직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얼마 전 회사를 퇴사한 A씨는 여전히 전 직장에서의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A씨는 “여러 가지 형태 회사를 경험하면서 내게 맞는 회사를 찾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질 못했다”며 “탐색하려는 마음이 한국 정서엔 맞지 않는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싶은 자책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소통 창구는 달리 없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친구들은 상황을 가볍게 여겼다. “아버지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왜 못 버티느냐’고 했다”며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문을 두드린 곳이 서울연결처방이었다. A씨는 “여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간 어려움을 말하면 변명처럼 여겨지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했다.
A씨와 같은 이유로 콘텐츠를 신청한 청년 B씨는 “앞으로 들어갈 회사에서는 나를 지키면서도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들 앞에선 나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서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았다”며 “같은 아픔에 공감하며 대화한 게 위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더 통화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요즘은 괜찮으세요?”라고 묻는다. 서울복지재단 외로움안녕120 아웃바운드 상담사 C씨는 “전화는 50분간 최대 8회까지 진행할 수 있다”며 “이후 모니터링 상담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C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년 D씨였다. “D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넌 한 게 없어’라는 말을 들었고, 학교폭력도 겪었다”며 “부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D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본인이 먼저 전화해 ‘나도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며 “그저 들어주고 계속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몇 달 후 다시 연락했을 때, D씨는 취업하고 친구도 사귀었다며 “이제는 잘 지낸다”고 전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이 해소하는 것
외로움을 줄이는 건 대단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눈인사 한 번에서 시작된다.
마음편의점의 차 한 잔, 연결처방의 대화, 외로움안녕120의 상담 한 통이 서울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 외로움을 다루는 도시는 결국 행정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