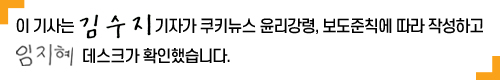신차 시장이 연말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번해 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다. 지난 6년간 반복돼온 인하·연장 기조가 이번에 멈추면, 차량 실구매가가 즉시 뛰게 되는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연내 출고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완성차업계 역시 내수 침체가 길어진 상황에서 개소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요 회복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값비싼 물건에 더 무거운 세금을…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는 본래 1970년대 후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입된 ‘특별소비세’에서 출발했다.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체계만으로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어렵고, 고가·사치성 물품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자동차는 컬러TV·고급 시계 등과 함께 대표적 사치재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 세제 개편을 거쳐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값비싼 물건에는 일반 소비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카드를 여러 차례 꺼내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세율을 1.5%까지 낮춘 적도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율을 다시 5%로 복귀할 경우 차종에 따라 실제 소비자 부담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가품인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 체감도는 단순 금액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정상 세율 ‘5%’를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장기간 유지된 3.5% 인하 세율이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하면서, 소비자들은 개소세 항목 자체를 알지 못해도 “차값이 지난해보다 비싸졌다”는 체감만으로 구매 시점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개소세 종료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고가 제품이지만 소비자는 100만원 내외의 차이에도 매우 민감하다”며 “나라 경제를 되살리게 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이런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비쿠폰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와 같은 것은 소비 진작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소세 종료가 전체 판매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실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개별소비세 자체를 따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고가 차량은 100만원 감면이 있어도 정책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종·소득 수준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전기차 구매자 등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