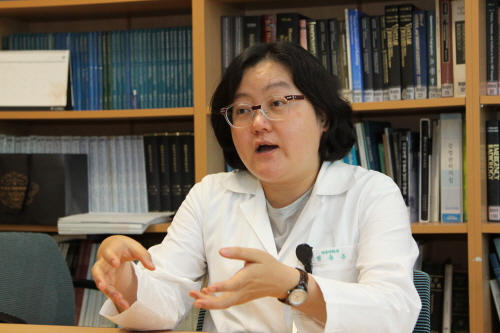
[K-이슈추적] 연재순서
① 의료방사선에 발목 잡힌 암 검진
② 프리미엄 검진…정밀하지만 방사선 피폭량 최대치 ‘두 얼굴’
③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교수 “의료방사선 위험성 걱정할 수준 아니다”
④ [현장에서] 의료행위 이득과 위해, 환자들만 혼란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품질이사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료방사선 위해는 추론일 뿐이라며 다만 단기간 내 재검진이 많은 국내 의료현실은 바로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회의 CT촬영으로 약 5~25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은 길을 걷다가 각종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또한 CT검사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살아남은 원폭 피해자에서 암과 백혈병 같은 질병이 발병한 수치를 보고 의료방사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100밀리시버트 미만의 낮은 선량에서 실제로 암이 증가하는지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선량이 낮아도 그 선량에 비례하는 만큼 낮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또 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듯이 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의료진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의료방사선을 우려하는 상황을 항암치료에 비유했다. 그는 “암환자들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항암치료를 받는다. 몸이 많이 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통해 좀더 오래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 하나만으로 치료를 받는다. 의료방사선은 항암치료처럼 눈에 보이는 부작용도 없음에도 위해정도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PET-CT, 복부CT를 쉽게 사용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의료사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검진을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또 이분법적으로 ‘검진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는 결론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상급병원에서 저선량CT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문제는 저선량의 기준이 없다. A병원은 1밀리시버트를 저선량이라고 하고 B병원은 3~4밀리시버트를 저선량이라고 말한다. A병원서 검진받은 환자에 비해 B병원서 검진받은 환자는 똑같은 저선량CT로 촬영했더라도 더 많이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저선량CT로 질환을 확인할 있지만 병원이 노후된 기기가 사용할 경우 저선량으로 찍을 수 없다. 병원은 이 사실을 환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일반 촬영을 하게 된다. 한번 찍은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저선량 CT추적검사를 직장검진에서 2년에 한번씩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의료방사선 위험이 걱정할 수준을 아니라면서 “50~60세 이상은 방사선 위해를 고려하지 않고 검진을 받는 것이 남은 평생을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30대 이하, 위험을 알 수 없지만 잦은 검진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다. 특히 초음파만으로 검진이 가능한 것을 CT로 찍는 등의 의료행위는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