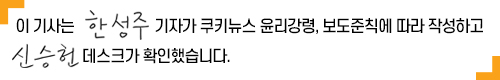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신약 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법률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규제과학센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은 성균 규제과학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제약·바이오 연구자와 기업들은 보수적인 국내 규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규제과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접근방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규제과학을 ‘모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을 평가하는 새로운 도구와 표준 및 접근법을 개발하는 과학’으로 정의한다. 가령 의약품의 경우,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의 기준치 등의 합리적인 수준 찾는 연구분야가 규제과학이다.
우리나라는 규제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거나, 기존의 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적극적 규제’가 과학기술 관련 제도 전반에 지배적인 기조다. 적극적 규제 환경에서는 명문으로 허용된 소수의 행위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 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규제 당국의 선진성을 인정받는 국가들은 ‘소극적 규제’ 기조가 지배적이다. 명문으로 금지된 행위 이외에는 모든 연구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혁신신약은 기존 기술과 약물 가운데 유사한 물질이 없다. 따라서 혁신신약의 개발에는 소극적 규제 환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신약개발에 불리한 환경은 기업과 환자 모두의 고충으로 이어진다. 임상시험 시도와 희귀질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축소한다.
지난해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물질 50개 가운데 20개는 희귀질환 치료제다. FDA가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과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후보물질을 우선 희귀질환 신약으로 론칭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다른 적응증을 확보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 반대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른바 ‘블록버스터’ 의약품 개발에 몰두한다. 연구개발 추진이 쉽지 않은 보수적인 규제 환경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요가 예측되고, 높은 매출이 보장되는 일반질환 치료제에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

국제적인 패러다임에 뒤쳐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장익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FDA는 벌써 1990년대 후반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D)와 심사인력에 대한 연구에 투자하면서 규제과학을 발전시켜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혁신신약 개발 방식을 적용하자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면 넓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지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규제과학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상당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규제기관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규제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이 신약 개발 단계별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기업과 규제기관의 컨설팅과 사전미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신약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상 요구되는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식 접근법에서, 효과와 안전성에 집중하는 근거 중심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