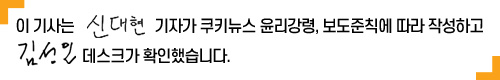치매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전문 의사에게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간 요양시설이 치매 환자를 수용해 관리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식으로 변모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사업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들로부터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상담, 비대면 진료, 방문 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시행하는 2차 연도에서 참여 지자체와 기관, 의사를 늘리고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가면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의 치매 치료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요양시설이 치매 환자를 수용해 관리해왔다면 지금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 후 주간보호센터나 가정에서 케어하는 방향으로 치료·관리 방식이 변화했다. 치매 정책의 목표를 말기 환자가 요양시설에 있는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설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정착하기까지 개선돼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초기에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의 참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전체 지원자 중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의료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전문 교육 시행에 지장을 줬다. 최 정책이사는 “이번 사태로 의료 현장이 어렵다 보니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치매 전문가 그룹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자문을 돕는 활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은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내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공보부회장은 “치매 치료·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물 흐르듯 끊임없는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타 기관들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서 “대학병원 교수,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촉탁의, 치매관리주치의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의사들과 환자가 연결된 ‘관리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