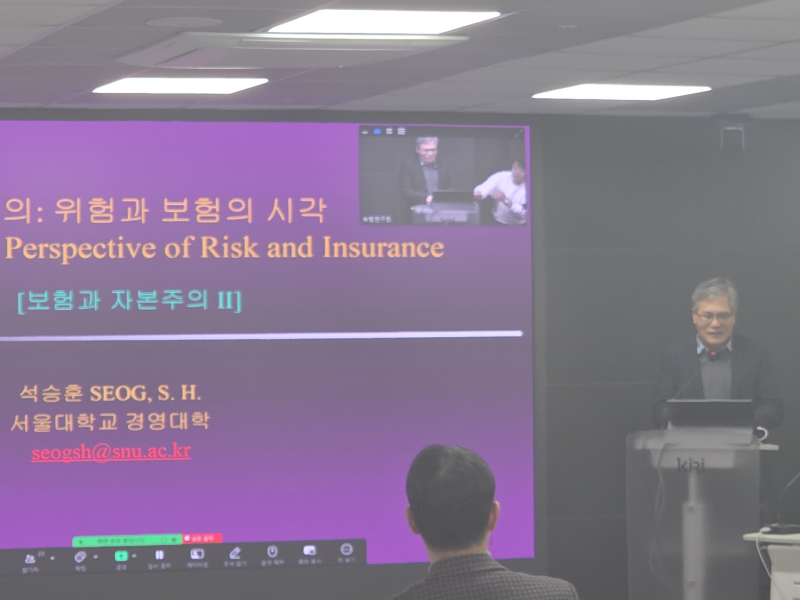
주식회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역사·제도적 분석이 나왔다.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단순한 이윤 창출 수단을 넘어, 본질적으로 ‘보험’처럼 위험을 분산·관리하는 방식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자본주의, 위험과 보험의 시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과 그 과정에서 보험이 수행해 온 역할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석승훈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식회사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이 과정에서 왜 ‘보험’과 같은 기능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했다.
“19세기 영국, 사람들이 회사가 되는 것에서 회사를 만드는 시대로”
우선 석 교수는 19세기 영국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짚었다. 그는 “1855년·1856년·1862년의 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식회사 개념이 ‘자신들이 회사가 되는 것’에서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적 주체’가 됐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회사는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됐다.
법인격 부여는 주주가 투자금 이상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의 근거가 됐다. 석 교수는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것이지 주주의 것이 아니다”며 “유한책임은 결국 주주의 위험을 회사로 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 이동 장치 때문에 주식회사가 ‘보험적’ 기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는 출자한 자본 외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위험은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산된다. 석 교수는 “이 메커니즘이 주식회사를 사실상 위험을 전가·흡수하는 ‘보험 기계’로 만든다”고 말했다. 결국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과 법인격이라는 ‘보험적 장치’를 통해 성립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한국 보험업계, 리스크 테이커에 지나치게 박해”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보험업계가 위험을 떠안는 주체인 리스크 테이커(보험사)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 충분한 금융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지난 30년간 한국 보험업계는 외형 확대라는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질적 역량에서는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보험사들과 비교할 때 혁신과 성장의 ‘속도 차’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설명하는 사례로 2010년 상장 당시 삼성생명, 일본 다이치생명, 홍콩 AIA생명의 시가총액 흐름을 비교했다. 세 회사는 모두 20조원대에서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성장 곡선은 크게 갈렸다. 삼성생명은 20조~30조원대에 머물며 사실상 정체된 반면, 다이치생명은 50조원대로 확대됐고 AIA생명은 약 180조원까지 증가하며 상장 초기 대비 9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안 대표는 “AIA와 다이치생명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리스크 테이커로서 금융소비자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평가·제도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보험업계는 오랫동안 리스크 테이커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보험사의 사업 환경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주체가 없다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주체인 소비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리스크 테이커와 리스크 어버터 간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양측의 균형점을 찾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 보험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