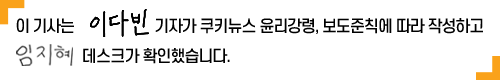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부터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각종 리스크에 잇따라 휘말리며 전방위적 위기 국면에 놓였다. 쿠팡의 경영 시스템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정보 등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 큰 논란은 쿠팡이 약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로 확인되면서 쿠팡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상태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쿠팡은 이미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물류센터 사망사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 측에 유리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수사·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주임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 검사 모두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된 상태다. 엄 전 지청장은 광주고검, 김 전 차장은 부산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문제에서도 쿠팡은 자유롭지 못하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올 하반기에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경기 광주시 ‘쿠팡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는 50대 근로자 A씨가 새벽 근무 도중 쓰러져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최종 부검 결과가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경기 화성 물류센터에서는 야간 근무 중이던 30대 근로자 B씨가 쓰러져 숨졌고, 8월에도 용인시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50대 근로자 C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각종 사건·사고가 연쇄적으로 드러나면서 쿠팡의 ‘로켓 성장’도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보보호, 노동 안전, 거버넌스 등에서 강화된 책임과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의 리스크를 단순히 기업 규모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고객과의 소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춰 성장해왔지만,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시장점유율 확대와 성장 전략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춰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 구조와 경영진 특성상 국내 소비자와의 밀착된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