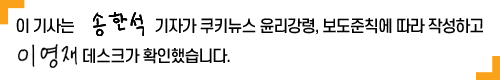데뷔 4년 차. 아직 신인이지만 진세민 아나운서의 현장 경험과 종목 스펙트럼은 단지 신인으로만 치부하기엔 더 깊고 넓다. 축구, 야구, F1, e스포츠를 넘나들며 국내외 현장을 직접 뛰어 ‘스포츠의 얼굴’로 자리 잡은 그는 “아직도 처음처럼 배우고 있다”며 웃었다.
진세민 아나운서는 지난 11월27일 서울 강서구 쿠팡플레이 스튜디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직접 가서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배우는 건 어떤 책이나 영상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진 아나운서가 “현장이 저를 키웠다”고 말하는 데에는 F1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F1이 따뜻한 나라에서 열리다 보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할 때가 많다”며 “시차, 현지 날씨, 수질 적응은 물론이고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도 많이 진행해야 해서 유연성, 임기응변이 중요하지만 결국 버티는 건 체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F1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예상 밖의 계기였다. 국제학부 전공 시절 흑인 인권 운동을 조사하며 루이스 해밀턴을 접했다. 진 아나운서는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인권 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쓰다가 스타들을 조사했는데 루이스 해밀턴이 가장 먼저 나왔다”며 “F1이라는 종목을 처음 접했고 규모가 매우 커서 궁금함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쿠팡플레이에서 리포터 채용 소식을 접하고 F1 중계를 찾아보며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F1의 매력을 묻자 “제가 경험한 스포츠 중 가장 팀 스포츠 같다. 차의 모든 퍼포먼스를 위해 수백 명의 팀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움직인다”며 “현장에서 방송에 잘 공개되지 않는 곳도 가보면 팀원들이 진짜 많은 게 느껴졌다.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힘줘 말했다.
진 아나운서가 F1에서 느낀 것은 단지 팀워크만이 아니었다. 레이스를 바라보는 선수들의 태도, 끝까지 완주하려는 의지는 그에게 ‘스포츠 철학’에 가까웠다. 진 아나운서는 “제가 20명의 드라이버를 ‘왜 다 응원하지’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추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완주 해내는 게 멋있다”며 “F1을 맡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애정, 팬심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현장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은 분명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난해 싱가포르 그랑프리 당시 피에르 가슬리 인터뷰였다. 진 아나운서는 “첫 단독 인터뷰였는데 가슬리가 피곤한 느낌으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제가 불어로 인사를 건네니 ‘너 프랑스어 어디서 배웠어?’라고 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며 “옆에 계시던 매니저님이 갈 시간이라고 끊었는데도 마지막 질문을 받아줬다”고 고마워했다.
조지 러셀과 인터뷰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밈’까지 만들어준 장면이다. 러셀이 그의 실버스톤 맨투맨을 보고 먼저 말을 건 것이 시작이었다. 진 아나운서는 “선수들 인터뷰 시간이 길어서 스몰토크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러셀이 먼저 ‘멋있다’고 해서 제가 더 놀랐다”며 “제가 먼저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선수가 꺼내주니까 인터뷰가 훨씬 자연스러웠다”고 웃었다.

야구·축구·e스포츠 현장도 그에게는 각기 다른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처음 인터뷰했을 때 진 아나운서는 “처음이라 너무 떨린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로버츠 감독이 “괜찮아. 천천히 말할게. 너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진 아나운서는 “그 기억이 진짜 오래간다. 덕분에 이벤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선수 인터뷰를 했지만 잘 해냈다”며 “로버츠 감독님의 미소가 생각이 난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꿈이 처음부터 아나운서는 아니었다. 진 아나운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수의사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동물을 치료할 때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냉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며 “동물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좋아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꿈꿨고 공교롭게도 ‘코로나 학번’과 겹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더 깊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진 아나운서는 “2년 동안 쿠팡플레이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과 리그를 경험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4년 차가 됐다”며 “아직 새내기 같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방송 2년을 할 때는 사고를 낼까 봐 떨리고 긴장했는데 이제는 많이 즐긴다”며 “최대한 밝고, 웃으며 하려고 한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심이다. 신인 마인드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각오를 쭉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세민 아나운서가 꿈꾸는 ‘좋은 아나운서’의 모습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 더 가까웠다. 그는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같이 일하기 좋은 아나운서’라고 말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F1 프레스오피서나 팀 매니저 분이 ‘네가 정말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선수들이 인터뷰 일정이 힘들었는데 많이 웃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가레스 베일 선수 인터뷰할 때도 관계자가 와서 인터뷰가 밝고 자연스럽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했다”고 웃었다.
끝으로 진 아나운서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최고의 칭찬”이라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평가’를 듣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