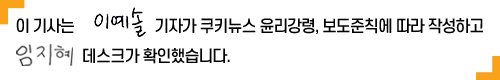차갑고 깨끗한 물은 좋은 맥주를 만든다. 강원 홍천군 홍천강을 끼고 선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이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다. 이 공장이 자리 잡으며 생긴 일자리는 지역의 일상이 됐다. 인구 7만이 채 되지 않는 산간 군(郡)에서 “군민이면 먼 친척 중 한 명쯤은 하이트진로 공장에 다닌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공장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키워왔기 때문이다.
16만평의 공장이 홍천에 들어선 건 1997년이다. 외환위기 여파로 전국이 흔들리던 시기, 하이트맥주(현 하이트진로)는 새로운 생산 거점을 물색하고 있었다. 당시 하이트진로 대표는 “뒤엔 산, 앞엔 강이 흐르는 곳이 맥주가 살기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공장은 도둔산 자락 아래, 홍천강을 품은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물맛이 맥주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홍천강의 청정 수질은 지금도 공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발효·저장탱크 108기(60만ℓ 규모)에서 최소 20일간 숙성 과정을 거쳐 테라·켈리·필라이트가 출고된다. 탱크 한 기 용량만 따져도 성인 한 명이 하루 10병씩 마셔도 330년은 걸릴 양이다.
김태환 품질관리팀장은 11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맥주는 98% 이상이 물이라 수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설비와 여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생산 현장은 쉼 없이 돌아간다. 발효·저장탱크가 줄지어 서 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병·캔·페트 용기가 끊임없이 오간다. 전 공정은 컴퓨터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앙통제실에서 맥주 생산 공정을 제어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50만㎘, 병맥주 기준 3억6500만 병에 달한다.
홍천강 물이 맥주로 변하는 과정은 바쁘고도 정교하다. 원료 보리가 사일로로 들어오면 싹을 말려 맥아로 만들고, 뜨거운 물과 섞어 끓여 단맛의 맥즙을 얻는다. 이후 쓴맛 성분과 단백질을 걸러내는 ‘자비’ 과정을 거쳐 급속 냉각하면 발효 단계로 넘어간다.
식당에서 회수된 병은 초당 17개, 시간당 6만6000병씩 고온 세척되고, 밀폐된 무균실에서 충전과 밀봉이 동시에 이뤄진다. 라벨을 붙이고 나면 출고를 기다리는 완제품이 된다. 철제 탱크와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장은 ‘동양 최대 규모 자동화 양조 라인’이라는 수식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의 생산 현장은 자동화돼 있지만,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화정 생산지원팀장은 공장 설립 때부터 근무한 초창기 멤버다.
이 팀장은 “현재 공장에는 350여명이 근무하는데, 초창기에는 직원의 90%가 홍천 출신이었다”며 “지금도 6~70%는 군민이다.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가량 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한 다리 건너면 공장 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장은 일자리뿐 아니라 지역 생활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존재감이 가시화된 계기가 지난 2009년 도시가스 공급 논의였다. 당시 홍천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던 지역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면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필요했다.
이 팀장은 “공장에서 연료를 LNG로 전환하면 지역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해 함께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료보다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생기긴 했지만, 지역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선택을 계기로 홍천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됐다.

하이트진로는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공장 밖으로 넓히고 있다. 홍천군이 먼저 제안해 시작된 ‘홍천강 별빛음악·맥주축제’는 내년이면 10회를 맞는다. 매년 여름 수천 명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농특산물 판매, 플리마켓,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체험형 콘텐츠가 결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장 견학 프로그램 역시 홍천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하이트피아’를 전면 리뉴얼해 지난해 8월 ‘하이트진로 파크’로 재개장했다. 360도 LED 영상관, 브랜드 역사관, 굿즈숍,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공간을 둘러보고 나면, 홍천강을 내려다보는 시음장에서 갓 생산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약 1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