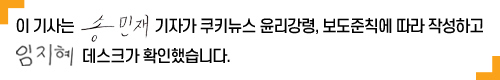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목표 미달 시 부과되는 기여금 부담이 업계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기여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간 저공해 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공해차 판매 비중은 올해 28%에서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로 단계적으로 상향된 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와 수입사에는 현재 1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여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현재 판매 구조와 목표 간 괴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전동화 전환에 적극적이었던 현대자동차도 내수 판매에서 무공해차 비중이 8.37%에 그쳤고, 기아 역시 전기차 비중이 10% 안팎에 머물렀다.
현재와 유사한 판매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목표치인 50%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미달 물량은 업체별로 수만 대에 이를 수 있다. 또 지난해 판매 구조를 기준으로 올해 저공해차 목표인 28%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기여금 부담이 10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2028년 이후 기여금이 두 배로 상향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친환경차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적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 역시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판매 1대당 0.3점만 인정돼, 3~4대를 팔아야 전기차 1대와 동일한 실적으로 산정된다. 친환경차 판매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아직 정책 목표만큼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중을 끌어올리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며 “목표 미달 시 상당한 금액의 기여금까지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차 중심의 수입 브랜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전기차 국내 판매량은 총 9만1253대로 전년 대비 84.4% 상승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특히 상당 부분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 효과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목표 설정과 기여금 부담 구조가 국내 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표 설정 이전에 데이터 기반 검증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이 그간의 국내 전기차 판매‧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됐어야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없이 목표가 먼저 설정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감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기여금 규모가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시장 특성과 판매 구조를 고려하면, 일괄적인 목표와 기여금 적용은 결과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위축이나 산업 전반의 부작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