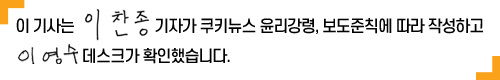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 챙겨먹기’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영양제와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유통 채널과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꼼꼼한 소비자들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는 영양제 시장의 모습과 그에 따른 부작용, 슬기로운 영양제 복용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총 다섯 편에 걸쳐 영양제 소비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SNS에서 보고 샀는데, 이거 먹으면 정말 아이 키가 10㎝ 더 클까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에게는 하루에도 수차례 비슷한 질문이 이어진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맘카페 등에서 본 광고를 믿고 아이의 영양제를 구입했다가 성분이나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약국을 찾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부모가 인터넷을 보고 구한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며 직장인 자녀들도 약국문을 두드린다. 또 복용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20~30대의 방문도 꾸준하다.
최근 SNS에서는 ‘지방세포를 죽이는 영양제’, ‘혈관을 청소해주는 영양제’, ‘아이 키를 10㎝ 키워준다는 영양제’ 등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확한 성분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게시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약사 A씨는 “부모님이 SNS를 보고 구입한 영양제를 복용한 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온 적이 있다”며 “다이어트 영양제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황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중국산 차였던 경우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2045건이다. 2022년 4069건, 2023년 4902건, 2024년 3798건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다만 단속이 강화되면서 광고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단 사람에게만 개인 메시지로 구매 링크를 보내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SNS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 대부분이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치면서,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우려해 약사회 차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폐업 후 새 업체를 차리고 신규 홍보 계정을 만들어 다시 광고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가능성이 낮고 제재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면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크게 작동하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SNS에 국한되지 않는다. 케이블TV나 홈쇼핑으로 노출되는 영양제 광고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고 약국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혈관을 청소하는 듯한 과장된 CG와 자극적인 문구가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일부 영양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B씨는 “수술을 앞둔 환자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오메가3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TV 광고에서는 이런 주의사항을 거의 알리지 않은 채 ‘혈관 청소제’라는 표현으로 홍보하다 보니, 그대로 믿고 구매하려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SNS부터 케이블 채널까지 이어지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공통된 문제점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에게 효능과 효과를 과도하게 부각한다는 점”이라며 “아이를 둔 부모나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의·약사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