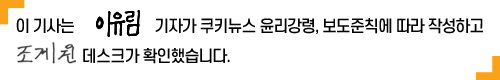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 약 9900가구를 공급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자체 협의 등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로 서울에 약 99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주요 대상지로는 △서울의료원(500가구) △쌍문동 연구시설(1200가구) △성수동 기마대 부지(300가구) △용산 유수지(50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00가구) 등이다. 정부는 도심 내 오래되고 낡은 공공청사를 철거한 뒤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SOC를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청년층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청사를 허물고 높게 지어 저층부에는 청사를, 고층부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식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주거·업무 시설과 함께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약 6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퇴계로 4가 일대 우체국은 재건축을 통해 상부에 행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 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도 복합개발 대상지로 제시됐다.
다만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난관이 적지 않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8년간 전체 42곳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3곳(7.1%)에 불과했다.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가 꼽힌다. 이 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공식까지 진행됐지만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3년간 조사가 이어졌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사업비 문제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송파구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로 구조적·행정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저층부에는 청사를, 고층부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주택 공급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관공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할 장소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민 반발까지 겹치면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 절차가 별도 과정 없이 일괄 처리된다. 즉,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으로 통합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는 특별법 도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진다”며 “특별법을 통해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