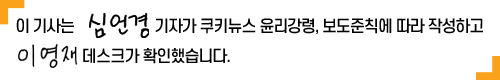“어떤 장르든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 최우식(36)이 영화 ‘넘버원’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거인’ 이후 약 10년 만에 김태용 감독과 재회한 그는 더 좋은 작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컸단다. 괜히 의가 상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따랐다. 그러나 모두 기우였다. 최근 서울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같이 밝히며 “선택하길 잘했다. 지레 겁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넘버원’(감독 김태용)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최우식)이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장혜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다. 우와노 소라의 소설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를 원작으로 한다. 11일 개봉했다.
최우식은 극중 고등학생 하민과 직장인 하민을 오갔다. 30대 중반에 교복을 입어야 했다는 뜻이다. “짧게 지나가서 다행이었다”고 운을 뗀 그는 “아마 ‘넘버원’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한다. 고등학교에서 촬영하는 신에 실제로 고등학생 친구들이 들어올 때가 많다. 이제 몰입이 확 깨지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예전에는 빨리 나이 들어 보이고 고등학생 역할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젠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식에게는 교복뿐만 아니라 ‘부산 사투리’라는 숙제도 주어졌다. 최우식은 자신의 사투리 연기에 만족하는지 묻는 말에 “10점 만점에 4.5점”이라는 겸손한 답을 내놨다. 그는 “제가 안 까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편이다. 사투리는 조금만 이상해도 티가 나는데 감정 신까지 연기해야 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잡아갔다. 제가 사전에 딱 박히게 준비하면 자연스럽지 않게 될까 봐 조심스러웠다.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넘버원’의 주인공은 모자(母子)다. 서사 대부분이 이들의 관계 회복에 집중돼 있다. 배우들의 케미스트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이었다. 캐스팅은 훌륭했다. 최우식과 장혜진이 영화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아들과 엄마로 만났다. 최우식은 “저는 인복을 타고 난 것 같다. 정말 한결같으시다. 밝고 솔직하시고 엄마처럼 잘 케어해주셨다”며 “제가 본인 아드님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닮았더라.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 톤이랑 선배님 톤도 닮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우식은 하민과 달리 “딸 같은 아들”이다. 늦둥이인 그는 ‘사랑해’ 같은 표현도 스스럼없이 한단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다.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릴 때 ‘내가 이 나이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겠다’란 생각에 항상 불안했었다. 그런데 일에 치이고 주변을 챙기느라 가족의 유통기한을 놓칠 뻔했다”고 전했다. 부모님을 위해 요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윤스테이’에서 했던 떡갈비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넘버원’이 갖는 의미는 설 연휴에 선보이는 ‘스크린 복귀작’ 그 이상이었다. 최우식은 “‘거인’을 찍고 슬럼프가 컸다. 캐릭터에 잘 물들기도 했고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받고 부담감에 휩싸였었다. 이제는 좀 잘 빠져 나온다”며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충’을 할 수 있었고 ‘기생충’ 덕분에 또 지금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거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번 현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운명적으로 다 좋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