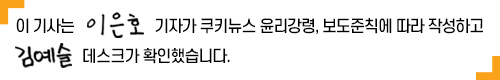벌금 낼 돈이 없어 유치장에 갇힌 한 여자. 먼저 온 ‘깜빵 선배’가 그를 위로한다. “기운 내. 원래 거지는 첫날이 제일 슬픈 거랬어.”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씩씩하다. “난 괜찮아.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닌 밤중에 상상은 무슨 상상? 그는 대답 대신 노래를 이어간다. “난/ 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해” 슬플 때 힙합을 춘다던 만화 ‘언플러그드 보이’ 속 한겸도 울고 갈 법한 발칙함의 소유자, 뮤지컬 ‘레드북’의 주인공 안나다.
안나가 벌금을 받게 된 사연은 기가 막힌다. 그는 자신을 성희롱하는 사장에게 “혹시 발정 났냐. 그래서 거시기 대신 주둥이를 놀리냐”고 맞섰다가 도리어 경찰에 붙잡힌다. 안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는 바야흐로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 여성은 자기 신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던 시절. 안나는 여성잡지 레드북에 연재한 소설에 성적 욕망과 성 경험을 묘사했다가 비난에 휩싸인다. 가는 곳마다 그를 돌연변이 취급한다. 안나는 묻는다. “난 뭐지, 난 뭐지, 난 뭐지…”
지난달 14일 개막한 ‘레드북’은 성차별 시대에 맞서 자신을 지킨 여성 소설가 안나의 이야기다.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와 발랄한 분위기가 매력이라 2018년 초연 때부터 ‘갓극’(god劇)으로 불렸다. 명성은 이번 세 번째 시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티켓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 매겨진 ‘레드북’ 평점은 10점 만점에 9.8점. 대작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데스노트’와 맞먹는 점수다.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 4관왕(작품상·연출상·음악상·여우주연상), 제7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4관왕(극본상·음악상·여우주연상·여우조연상) 등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안나는 허구 인물이지만 실제 여성 작가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많다. 가령 이런 장면. 안나가 쓴 소설은 저속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 내놓은 소설 ‘폭풍의 언덕’도 그랬다. 주인공 세 남녀 사이 애증을 그린 이 소설은 출간 당시 비도덕적이며 천박하다고 손가락질당했다. 안나의 연인 브라운이 재판에서 신경 쇠약을 주장하자고 제안하는 장면은 19세기 미국의 일기 작가 앨리스 제임스를 떠올리게 한다. 앨리스는 여성의 자의식을 꺾는 가부장제 질서에 글쓰기로 저항하지만, 사회는 그가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을 오랜 시간 히스테리로만 규정했다.
안나는 온갖 수모와 고초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인식한다. 이 작품 대표곡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은 “난 뭐지”라는 안나의 처음 질문에 그 스스로 찾아낸 대답이다. 안나는 이 곡에서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티 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의 노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얻어 갈 수 있는 점도 ‘레드북’의 미덕이다. 꾸밈이나 제약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글에 담으라는 로렐라이의 노래는 이야기꾼을 향한 응원으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질 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라는 가사는 투쟁하는 소수자들에게 보내는 격려로 읽힌다.
‘레드북’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콤비 한정석 작가와 이선영 작곡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준다. 아기자기하고 일사불란한 장면 전환은 박소영 연출의 솜씨다. 안나 역은 배우 민경아, 박진주, 옥주현이 번갈아 연기한다. 세 사람 모두 ‘레드북’에 처음 입성한 ‘뉴캐’다. 안나의 연인이자 변호사인 브라운은 배우 송원근, 신성민, 김성규가 맡는다. 공연은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 연건동 홍익대학교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어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