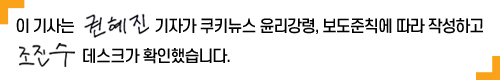#일명 ‘쿡룰(Kuk Rule)’은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옮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재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세종 이전파’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운을 띄웠는데요.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보안 문제, 균형발전 전략 등이 꼽힙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과 서울에 각각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이원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다”며 즉각 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세종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단을 내리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수도의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완한 것이 바로 ‘단계적 이전파’입니다. 이들은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복귀한 후, 장기적으로는 세종 등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다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마지막 정착지”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일단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 규모를 줄여 일할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는 청와대 대부분이 일반에 공개됐으나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된 여민관은 개방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어 “미국의 백악관을 모델로 청와대 규모를 줄여 일할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개방하는 안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이전파’입니다. 주로 국민의힘에서 역사적 상징성과 지속성, 비용 등을 이유로 청와대 복귀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 15일 비전 발표를 통해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일이 먼저”라며 우선 용산으로 들어간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은 6월 3일 투표가 끝난 직후 다음 날 바로 취임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움이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급히 이전했을 당시 정부가 밝힌 직접 비용만 5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국토 운영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