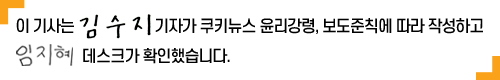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층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천장에 걸린 항공사 카운터 안내판에는 한글이 사라지고, ‘Korean’, ‘Jeju Air’, ‘Jin Air’ 같은 영문 로고만 빽빽하다. 셀프체크인 기기 화면도, 운항 정보 스크린도 사정은 같다. 공항 안 어디를 봐도 한국어로 항공사를 찾기 어렵다. 이곳 이용객의 83%가 국내선 승객이지만, 공항은 여전히 영어 중심의 안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뭣이 진에어여?”
기자가 지난 14일 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층 입구에서 만난 최문경(72)씨는 출발 전부터 길을 잃었다. 천장에 걸린 항공사 안내판 모두 영어 로고뿐이라, 어디가 자신이 탈 항공사 카운터인지 알 수 없었다. 기자가 동행해 진에어 카운터 앞으로 안내하자, 이번엔 교통약자 셀프 체크인 기기 앞에서 다시 멈칫했다. 항공사 선택 화면에도 영어 로고만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체크인을 마친 뒤 최씨는 운항 정보 스크린을 바라보다 “진에어는 무슨 색이냐”라고 물었다. 초록색 로고가 진에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했다. 그는 “내가 지금 해외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는데 왜 영어로만 되어 있냐”며 “영어 잘하는 사람만 비행기 타라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대부분 항공사는 영어가 글로벌 공용어라는 이유로 영문 로고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에도 영문을 써왔기에 한글 병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또한 “영어가 세계적 공용어이기에 영문 CI를 중심으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안내판에서는 한글 로고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편이 계속되는데도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FIDS(운항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와 셀프체크인 기계 플랫폼만 제공하고, 항공사 로고(CI)는 해당 항공사에서 전달받는 방식”이라며 “저작권 문제로 공항 측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한글 표기를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항은 틀만 제공하고, 각 항공사가 전달한 이미지를 그대로 표시하는 구조다.
반면, 한 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면 한글 CI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사가 이미 한글 로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공항 차원에서 표준 안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 항공사가 “요청이 오면 언제든 한글 병기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결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침을 내려야 할 주체는 공항 공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모든 항공사가 한글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한글 병기를 영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다. 김포공항 셀프체크인 화면에서 ‘tway’ 영문 로고 아래에는 ‘티웨이항공’이 쓰여있고, ‘EASTAR JET’ 밑엔 ‘이스타항공’이 병기돼 있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글 표기를 해야 한다”며 “국내 공항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탑승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항공사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식 명칭이 영문 진에어(Jin Air)라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안다”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측은 시정 의사를 보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한글사명 병기는 필요시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글 병기가 단순한 디자인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국제공항에서는 영어가 기본 표기 언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한글 병기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셀프체크인 기기나 FIDS(운항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 화면이 영어로만 되어 있으면 어르신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 쉽다”며 “티웨이·이스타항공처럼 이미 한글 표기를 병행하는 항공사가 있는 만큼, 공항과 항공사가 이를 표준화해 적용한다면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