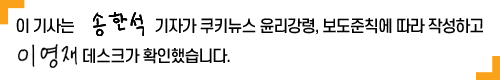러시아 연해주는 한인들이 모여 살며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학교, 의병 조직이 생겨나며 국외 독립운동의 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졌다. 남은 것은 무너진 건물과 희미한 표식,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지키는 이들의 기억뿐이다.
개척리의 변화, 남아 있는 정신
‘독립운동의 성지’ 신한촌이 건설되기 전 한인 거주지 ‘개척리’가 있었다. 개척리 마을은 금각만 북변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한복판을 길게 뻗는 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포그라니치나야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서 한인이 집단 이주를 해 형성한 마을이 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이 주필을 맡았고 순한글 신문이던 해조신문사가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준비하는 정보와 지원을 받은 대동공보사도 존재했다.

다만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걷는 동안 현재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대동공보사가 위치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장소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한때 한인들이 돌아다니던 거리는 러시아 청년들의 발걸음만 오간다. 최재형이 살았던 주택 역시 다른 이의 삶터가 돼 있었다.
선로를 넘어 거리 끝에 다다르자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이 있었다. 한인들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외교공관이 서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이어짐을 보여준다. 사라진 마을 대신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남은 셈이다.

사라진 마을, 남은 이름 ‘신한촌’
1911년 봄, 장티푸스가 개척리에 확산하자 러시아는 전염병을 핑계로 한인들의 집단이주를 명령했다.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북쪽으로 이동해 새 터전을 세웠다. 그곳이 바로 ‘신한촌’이다.
이후 신한촌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한민학교가 설립돼 민족교육이 이뤄졌고, 권업회와 노인동맹당이 조직됐다. 이곳에서 신문이 발간되고, 군자금이 모였으며, 청년들은 무장투쟁의 길로 나섰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마을이 사라졌고 현재는 아파트 주택 지대로 변해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다행히 1999년 한민족연구소의 모금으로 세워진 신한촌 기념비가 그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는 큰 기둥 세 개와 작은 비석 여덟 개가 자리해 있다. 큰 기둥은 고려인·북한·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작은 비석은 8도를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최재형, 이상설의 흔적을 따라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들의 삶과 독립운동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들이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최재형 고택’은 상징적이다. 러시아어로 페치카(난로)로 불리던 최재형 선생은 재산을 모두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그의 집은 한때 독립운동가들의 회의 장소이자 피신처였다.

현재 러시아 우수리스크에는 국가보훈부가 조성한 최재형 기념관이 있다. 대문 앞에 ‘독립운동가 최재형 고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흉상과 기념비가 우리를 마주했다. 기념관 내부는 러시아 땅에서의 독립운동이 생생히 재현돼 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도 같은 길 위에 있다.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그는 ‘한글 교육’과 ‘민족 계몽’을 강조하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의 사상을 넓혀갔다. 이상설 선생은 1917년 “유해를 화장하고 유품을 모두 불태워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유언에 따라 유해는 수이펀강변에 뿌려졌고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유허비를 이곳에 세웠다.

유허비는 폭 1m, 높이 2.5m의 화강암 석조물이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홀로 강가에 서 있다. 해마다 홍수철이면 강물이 차오르며 침수 피해를 입고, 각종 쓰레기가 밀려들어 주변이 몸살을 앓는다. 관리의 손길이 시급해 보이는 모습이다.
사람은 떠나고 건물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한인의 이름과 정신이 남아 있다. 신한촌의 표석, 최재형 고택, 개척리의 터전 속에는 조국을 잃고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광복 80년, 러시아 연해주의 길을 걸으며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은 사라졌어도 그 정신만은 이곳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