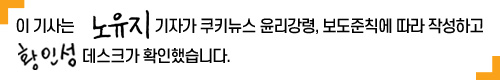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였지만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 위탁이라는 ‘응급 처방’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곧바로 매립지에 묻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소각재나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이 예고됐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내년 1월1일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5년 가까운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서울은 소각장을 비롯한 공공 처리시설 확대에 사실상 실패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제도 시행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치구들이 각자 용역 계약을 서두르며 대응에 나섰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 위탁 계약을 마쳤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공고를 보면 강동·관악·광진·구로·금천·동작·성동·영등포구는 3년에 걸친 장기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강북·강서·마포·서초·송파·용산·은평구 등은 긴급 공고를 통해 업체 확보에 나섰다. 최소 15개 구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민간 처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특히 최근까지 구내 공공 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나 소규모 자체 시설에 의존해 온 금천·은평구는 위탁 물량도 많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위탁 물량은 금천구가 3년간 6만톤(126억원), 은평구가 1년간 3만6000톤(72억원)에 달한다. 구내 공공 소각장을 운영해 온 마포구가 내년 1년간 5400톤 처리 대가로 13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과 대비된다.

기존 공공 소각장을 이용 중인 자치구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서울 생활폐기물은 약 21만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톤)의 19%에 달한다.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 4곳을 개선하거나 증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 물량까지 소각해야 하는 구조다.
각자도생의 결과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들이 제시한 민간 처리 기초금액은 톤당 평균 19만원을 웃돈다. 한 구 관계자는 “소각 처리 단가가 워낙 높아 재활용 위탁 처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환경·안전 우려도 제기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민간 소각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량이 적고, 이로 인해 소각로 온도가 떨어지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각 과정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고된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단체가 대규모 공공 소각장 확충 등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나마 공공 중심의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최근 2030년까지 공공 소각장 21곳을 신설·증설해 직매립 폐기물 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각 시군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님비 현상’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편 마포구는 이에 대비해 내년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각장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는 지난 7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2심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공 소각장) 신규 설치에 대한 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