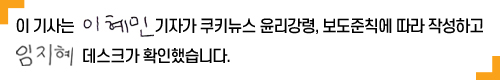“DDR5 16기가 한 개에 8만원 하던 게, 추석 지나고 40만원까지 찍었어요. 지금은 아예 안 나가요. 고치러 오는 사람만 있고 새로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 가격에 사고 싶겠습니까.” (선인상가 내 조립PC 매장 상인 A씨)
한때 ‘조립 PC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용산 선인상가. 메모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 A씨의 한숨은 깊다. 가격표를 붙여놓는 게 의미가 없고, 손님이 견적을 보고 오더라도 ‘이미 가격이 또 올라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현장의 체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3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월 PC용 범용 D램(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1.50달러로, 지난해 12월(9.30달러)보다 23.66% 올랐다. 2025년 4월 1.65달러에서 10개월 연속 오르며 약 7배 가까이 뛴 것이다. 2016년 6월 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메모리카드· USB 등에 쓰이는 범용 낸드플래시(128Gb 16Gx8 MLC)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9.46달러로, 한 달 새 64.83% 급등했다.

이러한 ‘메모리플레이션’의 주범은 역설적이게도 ‘AI 열풍’이다. 메모리플레이션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노트북·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 완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가 쓰는 서버용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이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상태가 되면서, 글로벌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HBM·서버용 D램 중심으로 생산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PC용 구형 D램(DDR4)의 생산 비중은 대폭 줄였다. 그 여파로 PC·노트북에 쓰이는 범용 D램, 특히 레거시 규격인 DDR4의 가용 물량이 빠듯해지며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PC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재고가 바닥났고,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공급자(반도체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 ‘PC용 D램’ 계약가격 상승률을 55~60%로 예상했으나, 최근 90~95% 이상으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것이다.
메모리플레이션이 반영된 신학기 노트북 가격대는 이미 300만원을 훌쩍 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2026년 초 내놓은 ‘갤럭시북6 프로’ 출고가는 공식 발표 기준 260만~351만원이다. 전작 ‘갤럭시북5 프로’(176만8000~280만8000원) 상단 기준으로 약 70만원 올랐다.
LG전자의 ‘그램 프로 AI’ 16인치 역시 출고가가 3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사양의 모델보다 50만원가량 비싸졌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급등분을 완제품에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용산에서 15년째 PC 부품을 판매해 온 상인 B씨는 “코로나나 비트코인 채굴 대란 때도 반년 넘게 가격 상승이 이어진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300~400% 이상, 아니 700% 가까이 오르는 건 처음 본다”며 “(이 상승세가)얼마나 오래 갈지 가늠도 안 간다”고 말했다.
용산 현장에서는 ‘가격표’만큼이나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들이 입을 모아 “고치러는 오지만 새로 사려는 손님은 줄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 강세가 길어질수록 노트북·조립PC 시장에서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전작 재고·리퍼·중고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