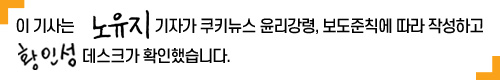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맡은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여파로 서울 자치구와 장기 용역 계약을 맺은 일부 소각·재활용 시설이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각 자치구가 개별 대응에 나서면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충청권 “발생지 처리 원칙”…계약 차질 현실화
충남도는 지난 5일 천안·당진 민간 소각장을 점검해 업체 1곳에서 미신고 폐기물 무단 반입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영등포구와 계약한 시설 2곳도 점검 대상이었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자치구에 반출 불가를 통보한 셈이다.
강동구는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이후 해당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충남도에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했다. 업체가 “점검 기간 중 반입 물량이 없었다”고 설명한 내용을 충남도가 “앞으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오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공동도급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오는 5월8일부터 약 한 달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반입이 막힐 경우 대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천구도 충남도의 점검 여파로 3년 장기 용역 계약이 파기됐다. 충남도가 공주·서산 재활용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섞인 종량제 봉투를 적발하면서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연간 1만2000톤 규모 계약도 종료됐다. 금천구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강경 기조는 충북·대전·세종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 “사전 협의 부족…감량 중심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한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며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면서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비슷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쓰레기 처리보다 감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쓰레기를 덜 만들기 위한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세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비교적 손쉬운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서, 언젠가는 봉착할 수밖에 없던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