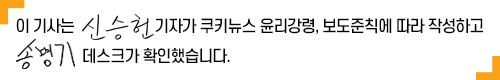2020년 1월20일. 몹쓸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날부터 우리는 24개월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 특히 생업의 터전이 병원인 사람들은 더 했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이들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올해 바람을 들어봤다.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7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경기도 일산 동구). 이 병원에는 12병상을 갖춘 코로나19 중환자실이 있다. 호흡기내과 이정모 교수는 일산병원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로 그날 중환자실 전담의로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여왔다.
이 교수는 기자가 병원을 찾은 날에도 지난 1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체크했고, 오늘 할 일을 정리했다. 다만, 오늘 아침 회의실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다. 환자 2명이 밤사이 세상과 작별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의사가 그렇겠지만, 환자가 돌아가시는 게 제일 힘들다. 모든 분들이 회복해서 (병원을)나가면 좋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오전 9시30분, 이 교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려는 듯 10여분에 걸쳐 레벨D 방호복을 꼼꼼히 갖춰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의식이 없는 코로나19 중환자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의료진들이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엎드려 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기 위해 6명이 달라붙었다. 이 교수는 환자의 자세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기도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유심히 살폈다. 이 일이 끝나고는 다른 중환자들을 회진했다. 그러고 나니 시계바늘은 어느새 11시30분을 가리켰다.

이 교수는 점심식사 전후로는 병원 내 컨퍼런스 등에 참석해 다른 의료진들과 지견을 나눈다. 회의의 성격과 목적은 요일마다 다르다.
이후 오후시간에는 외래 진료를 보거나, 중환자실의 보호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입원했는데 면회를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환자가 의식까지 없으면 소식을 알 길이 없다. 보호자가 얼마나 답답하겠나”고 말했다. 그래서 보호자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인다고. 다만, 환자의 배우자·자녀·친지 등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받다보니 과부하가 걸려 지금은 주(主)보호자 1명에게만 창구를 열었다. 이러한 업무를 마치면 다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이처럼 바쁘게 하루를 살다보니 퇴근시간(오후 6시)이 금방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11월말 이후에는 정시에 퇴근한 날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젠 몸도 힘들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런 이정모 교수의 올해 바람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쓸지언정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만큼 매사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에게 미안한 게 많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태어난 둘째를 거의 데리고 다니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부정(父情)을 드러냈다.
의사로서는 방호복을 벗고 예전처럼 환자들과 교감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또 “사실 의사보다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더 많이 대면하고 소통한다”면서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써줬으면 한다. 코로나19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위험수당이라도 더 챙겨주면 좋겠다”고 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환자실 식구들! 힘드신 거 압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믿고 그때까지 다들 같이 버팁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담담한 어조로 동료들에게 건넨 이정모 교수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래, 언젠가는 봄이 온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