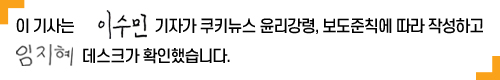“흑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는데, 체감 경기는 오히려 불황 같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 A씨의 말이다. 수주 호황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훈풍까지 겹치며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정작 ‘조선의 도시’로 불리는 경남 거제와 부산은 활기를 잃었다. 일감은 넘치지만 사람은 부족하고, 남은 인력도 고령화와 불안정한 처우에 지쳐 있다.
거제시 데이터포털의 지난해 조선소 종사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만명을 넘겼던 조선소 종사자는 최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만명 선에 머물러 있다. 연령대도 기형적이다.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어 현재 취업자수 비율 중 50-64세가 4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내 조선업 종사자 중 40-50대 비중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2분기 동남권 인구 통계에서는 청년 인구 순유출율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도시지만, 숙련공 부족은 심각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부산과 거제 지역의 숙련 인력 중 50세 이상 비중이 42%인 반면, 20~39세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조선협회가 발표한 숙련 인력 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입 기능인력이 현장에 완전 배치돼 독립적인 공정을 수행하기까지는 4~5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장기 근속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러한 공백은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는 실정이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거제의 양대 조선소 E9(비전문취업 비자),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노동자 수는 9732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546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조선업 환경을 온전히 메우기 어렵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언어 장벽 탓에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일정 기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익명의 거제 현장 근로자 B씨는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대체로 돈 벌고 자국으로 가버렸다”며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숙련공이 되지만, 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통상 9년이다, 만료 시일에 맞춰 본국에 회귀하는 편이고, 다시 열악한 이곳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토로했다.
현장에 남은 인력은 불안하다. 낮은 기본급과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주로 운영돼 온 업계 관행이 현장 인력들의 유출을 심화하는 구조라고 노동계는 말한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동계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구조’라고 반박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에 조선업 근무 시간이 줄어들며 납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단순 논리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조선소 근무자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초과 수당 대신 기본급 인상과 같은 안정된 임금 체계가 가장 필요합니다.” (김한주 전국금속노조 언론국장)
더구나 현장은 고온과 중량물을 다루는 공정이 많아 늘 산재 위험까지 뒤따른다. 경남 지역의 조선업 전문 노무사는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 보니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청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호황에도 불구하고 거제와 부산은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 없는 호황, 고령화된 숙련공, 불안정한 임금·안전 구조가 겹치면서 ‘마스가 훈풍’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조선소 근로자 C씨는 “10여년 전 불황기 때 하청업체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인력 감축 경험으로 불안감이 여전한 분위기”라며 “장기 근속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쉽지 않았다. 안정적 임금 체계 구축과 더불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 지역도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