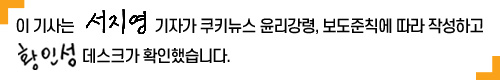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한 누리꾼이 인종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구청장이 나서 설득에 나섰고 결국 업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 후 관련 문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비록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중(嫌中)’ 정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국인을 향한 혐오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멸공’, ‘X개’ 등 중국 혐오를 드러내는 신고 집회 건수가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5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명동 상인 등의 요청으로 혐중 시위를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하자, 결국 이주민 단체와 시민사회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서울 대림동과 명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참여한 귀화 이주민 주성만씨는 “조선족으로 10년, 한국인으로 20년을 살아온 저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SNS에서는 “노 키즈존과 노 재팬도 있는데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 차이나 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0대 B씨는 “오죽했으면 업장이 그랬겠느냐”며 “침 뱉고 고성방가하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이해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모씨(28)는 “‘노 차이니즈 존’은 소수 중국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핑계 삼아 전체 중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 정서가 문화처럼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와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 및 뉴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중 표현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화처럼 통용됐는데, 이를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되레 스피커가 돼 악용하고 있어 문제”라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는 균형의 책임이 없다 보니 혐오가 더 증폭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중국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것과 중국인을 공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비상계엄 정당화 명분에 중국 관련 이슈가 활용되면서 중국 혐오가 본격화됐다”면서 “혐오가 확산된 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혐중 정서를 이용해 될 수도 없고, 돼서는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단절시킬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혐중 정서 자체를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법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노골적 차별을 막는 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