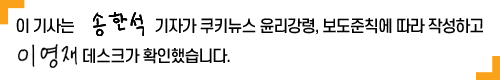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 플랫폼 1번. 대한 청년 안중근은 일본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일제 침략에 맞선 한국 민족의 강렬한 저항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 그 현장은 역사의 현장에서 기억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하얼빈역에 자리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하얼빈 의거 전모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다. 플랫폼 1번도 유리창 너머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앞에 서면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닌 한 세대가 품은 ‘국가 회복’ 염원이 선명히 다가온다.
단지동맹, 피로 쓴 독립 서문

1909년 2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근처에서 열두 명의 청년이 왼손 약지 첫 관절을 잘라 피로 맹세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김기룡, 황병길, 백규삼, 조응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김천화 등은 선혈로 ‘대한독립’을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 모임이 바로 동의단지회, 단지동맹으로 불린다.
단지동맹이 이루어졌던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남기기 위해 한국도 기념비를 만들었다. 기존 위치는 2001년 10월18일 크라스키노 추카보노 천변이었다. 그러나 상습 침수로 인한 보존·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근처에서 북방약용작물 영농단지 개발을 하고 있던 에코넷(유니베라, 유니젠 등의 홀딩스컴퍼니)이 도움을 주면서 2006년 11월19일 유비콤 1농장 경비실 옆으로 이전 설치됐다.

다만 러시아 국경관리정책 변경으로 이전 장소가 출입허가지역이 됐고 에코넷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새로운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하며 현재 위치로 옮겼다. 기존 기념비에는 단지동맹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 기념비에는 손바닥 도장과 함께 ‘1909년 3월5일 12인이 모이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그 앞에는 10년 단위로 연도를 기록한 조그마한 길이 있고 끝에 손바닥을 맞댈 수 있는 비석이 서 있다.
하얼빈으로 향한 결단, 군인 신분으로 쏘다
단지동맹 후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를 오가며 의병 재건에 몰두하면 안중근 의사는 대동공보사 주필 이강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긴 안중근 의사는 우덕순, 유동하 등과 만나 의거를 결의한다.

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0월24일 우덕순, 조도선은 채가구역에서 기다리고 안중근은 하얼빈으로 향한다. 거사 당일 오전 7시경,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역에 도착한다. 러시아 군대 뒤에서 이토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나가길 기다렸고 근처에 오자 안중근 의사는 품속에서 꺼낸 권총을 3차례 격발한다. 이후 ‘코레아 우라(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체포된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지금 한국 국토에서 한·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거사도 일부분”이라며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조국 독립과 동양평화를 행했다. 나의 공판은 국제공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 안중근의 정신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은 재판을 방해했고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1910년 3월26일, 안중근 의사는 뤼순감옥에서 순국했다. 그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언을 집행하려 한 두 동생을 강제 귀국시키며 의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후 유해 발굴 노력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다.

현재 자오린 공원(옛 하얼빈 공원)에는 ‘청초당(靑草塘)’이 새겨진 안중근 의사 유묵비가 있다. ‘푸른 풀이 돋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가리키던 청구(靑丘)와 같은 의미다. 봄에 푸른 풀이 돋아나듯 우리나라 독립도 곧 다가올 것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염원이 담긴 말이다. 해당 유묵비는 하얼빈 공원에 뼈를 묻었다가 해방이 되면 고향에 묻어달라는 안 의사의 유언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총성으로 비롯된 결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얼빈의 바람과 자오린 공원 유묵은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