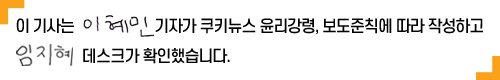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글로벌 독점을 깨고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핵심 소재가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술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지켜낼 보호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청과 산업계에 따르면, SK엔펄스 전·현직 직원 3명이 최근 블랭크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공장 설계도 등 핵심 자료를 빼낸 뒤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공장 건설을 추진한 정황이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기술이 실제로 유출되기 전에 차단했다.
일본 독점 깬 ‘블랭크마스크’…중국의 첫 ‘표적’이 되다
문제가 된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기 전 사용하는 일종의 ‘도화지’ 역할을 하는 소재로,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의 출발점에 있어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본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등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왔으나, SK엔펄스가 2020년부터 국산화 투자를 시작해 2022년 하반기 개발에 성공하며 국내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국산화 성공 후 불과 2년 만에 기술 유출 시도가 발생하면서 중견기업의 보안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기업 중심 ‘낡은 보안체계’…수치로 확인된 중견기업 ‘보안 공백’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산업스파이 사건을 넘어, 중견·소부장 기업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경고’로 해석한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보호 체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은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는 △보안 전담 인력 부재 △기술자료 접근 통제 미흡 △협력사·위탁업체 관리 부실 △보안 교육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정부의 K-보안체계가 존재하지만, 내부자에 의한 유출 시도까지 실시간 감지·차단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에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상당수가 보안 전담조직을 두지 않는 등 중견·소부장 기업의 보안 공백이 확인됐다. 내부자 접근 통제 시스템 도입률은 대기업(89%)에 비해 중견·중소기업(24%)이 현저히 낮고, 보안 예산을 연 1억원 이하로 쓰는 중견기업도 78%에 달해, 국산화 기술 상당수가 보호 장치 없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의 기술 확보 전략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한 인력 스카우트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 자체를 직접 겨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엔펄스는 지난 9월 블랭크마스크 사업 부문을 중국 기업 창저우퓨전뉴머트리얼 등에 약 68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투자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맞춤형 보안체계 시급”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안등급 세분화 △중견·소부장 보안투자 의무화 △내부자 탐지 시스템 확대 △보안 인력·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화된 기술을 지키는 구조가 없다면 한국 반도체는 ‘개발은 우리가 하고, 수확은 중국이 하는’ 상황에 언제든 놓일 수 있다”며 “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