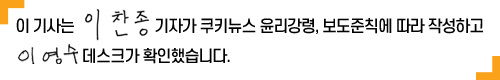의정갈등 이후 처음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10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내다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5일까지 2026년도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다. 1년 차 수련을 희망하는 의대생들은 모집 절차에 따라 각 병원에 지원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웠지만, 비수도권은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모집을 마쳤다. 정원을 채운 수도권 병원들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이전부터 이어진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사태가 다시 반복되자, 전문가들은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를 유지하려면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먼저 진료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비수도권 병원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계속 줄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이 비수도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환자가 서울로 몰리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악화 속도를 고려하면 10년 뒤에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더라도 현장에 투입될 시기에는 이미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교수 B씨는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이 은퇴하면 지역의료는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비수도권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 제한, 지역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와 병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감한 결단 없이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A씨는 “환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나치게 많은 전공의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분배와 수련의 질을 고려해 병원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금 필요한 것은 10년 뒤를 보는 대책이 아니라, 5년 뒤 비수도권 병원이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