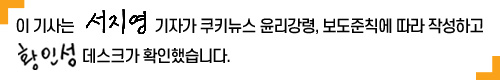“지하철은 파업해도 다니는데, 왜 버스는 한 대도 안 오나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진 14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같은 파업 상황에서도 지하철과 철도는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사실상 ‘멈춤’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차이는 제도에 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13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시작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당시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파업 여파는 수치로 확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9%에 그쳤다. 전날 오전 9시에는 전체 7018대 중 478대만 운행돼 6.8%의 운행률을 기록했다. 2년 전 파업 당시에도 운행률은 4%대에 머물렀다.
한 자릿수 운행률은 다른 교통수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지하철은 파업 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100%, 그 외 시간대에는 노선별로 65~79%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역시 약 60% 내외의 운행률이 적용된다.
이같은 차이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여부에서 비롯된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의 경우라도 최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파업 이후 후속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버스 역시 공공성을 전제로 한 준공영제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석은 제기돼 왔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진이 2017년 발표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 버스 정책의 핵심 목표를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로 평가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당시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노동3권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 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시내버스는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넓게 운영되던 시기에는 시내버스도 강한 파업 제한 대상이었지만, 노동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제도가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재로서는 파업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